이동통신사와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 정보를 활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취지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예고됐다.
9일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 활성화시켜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왔다. 경찰은 긴급출동 등 위기상황에서 고객 위치를 파악하는 데 정보를 활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시 전체 위치정보 요청 건수에서 와이파이 강제활성화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 이통사가 강제활성화 수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사가 위치 파악 신호를 발신하면 와이파이(꺼진 경우)가 자동 활성화돼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파이 위치 측정은 오차 범위가 20~50m로 최신 장비는 3~6m까지 정확도가 높다. 오차 범위가 150m에서 수 ㎞에 이르는 기지국 위치추적보다 훨씬 정확하다.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LG전자 단말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실내외 와이파이 정보 활용 플랫폼을 구축, 관련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사용자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경우엔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긴급구조 요청 시 와이파이를 강제 활성화해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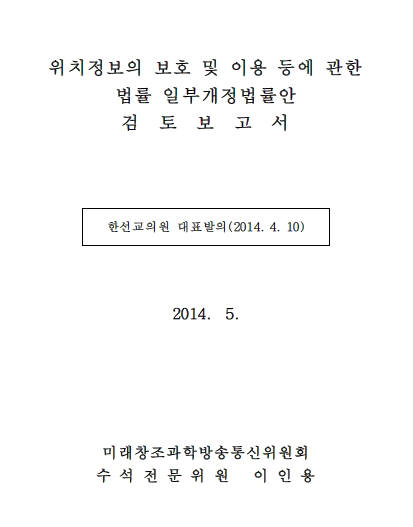
법안 제정 전인데도 이통사와 경찰이 이미 와이파이 강제 활성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명을 구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상황 때는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수다.
반면에 카톡 감청 논란 등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나온다.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로 강제 활성화 대상을 정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요청자, 요청일시,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보관토록 했다.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는 이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와이파이 강제 활성화 역시 위치정보법 개정안 같은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법안 제정 없이 와이파이를 강제 활성화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시행된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이미 고객 와이파이 정보 활용 근거가 있다”면서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해 소중한 국민 생명을 많이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외국과 같이 신고 때부터 여러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