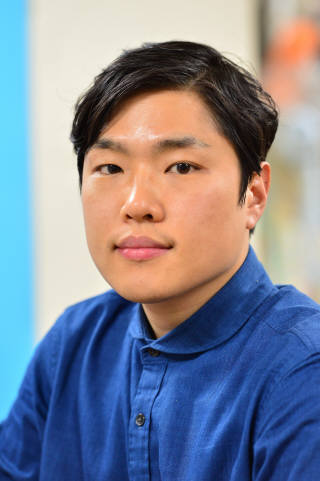
“셧다운 같은 게임 규제를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최근 내놓는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두고 게임업계 종사자가 종종 하는 말이다. '폐쇄' '도박' 등 강한 어조로 규제를 시사하는 정부 방침이 게임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일찍부터 사이버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게임 내 재화는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곳이 게임업계다. 게임업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에도 일찌감치 관심을 보였다. 말단 직원부터 대표까지 투자 성공담과 실패담이 넘쳐난다.
게임업계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은 현존하는 가상화폐가 당장 쓰기 어렵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언젠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사이버머니 일부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확신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에 기반을 둔다. 블록체인은 게임은 물론 여러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해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폄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이런 축에 끼지 못하는 아이템이다.
대부분 게임 전문가들은 한국 게임 산업이 정부 규제로 망가졌다는 주장에 일부만 동의한다. 한국 게임계가 2010년 전후로 겪은 불황은 내수 시장의 한계와 기존 성공에 안주했다는 자아비판론이 힘을 얻는다.
정부 규제가 방아쇠가 됐지만 충분조건은 업계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결국 지난해 반전을 일궈 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살아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투기와 투자를 가르는 기준은 결과에 그친 이야기일 가능성이 짙다.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성인 한정, 실명투자, 거래소 투명화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개인과 사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시장이 거품이라면 언젠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겪을 부작용은 지불해야 하는 사회 비용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