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에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중국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반도체 기술자 확보가 도시바 정상화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바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계기로 미에현 욧카이치와 이와테현 기타미시 공장에 신규 제조라인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필요한 기술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전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일본내 동종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데다 경쟁회사들도 고액의 보수를 제시하며 경력자 스카우트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 미국 등 외국 기업들도 기술자 스카우트 대열에 합류, 성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자 고갈이 심각하다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내 JR 가와사키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 빌딩 9층에 최근 낮선 기업이 입주했다. JYM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의 등기상 설립목적은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개발'이다. 3월 12일에 새로 법인등기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중국 국유기업인 칭화유니계열 창장메모리(YMTC)사다. 중국 국가 펀드가 3조 엔(약 29조3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메모리공장 건설을 맡은 회사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는 회사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YMTC는 2016년 가을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개발거점을 설치했다. 메모리업계의 큰 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에서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40명 규모로 개발을 시작했다. 가와사키역 부근에 마련한 거점은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넓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기술자 채용을 막 시작한 단계다.
가와사키역 난부센 노선 일대는 도요타자동차가 작년 여름 전기기술자 채용광고를 주요 역에 내걸어 화제가 됐던 곳이다. YMTC가 가와사키역에 거점을 마련한 것은 이 일대가 도시바와 후지쓰, NEC 등의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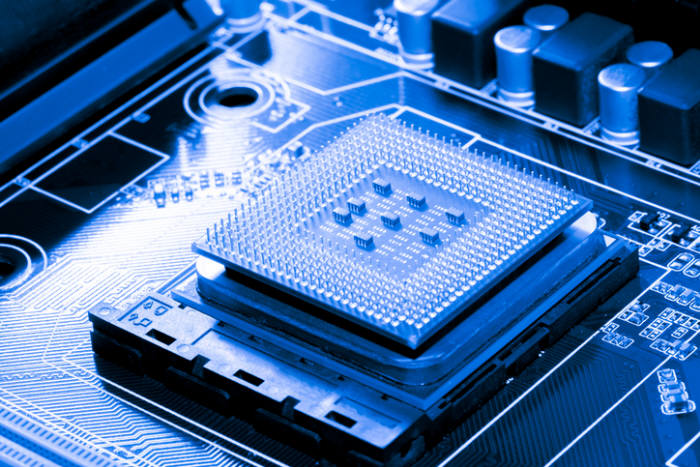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자동차 등 수요처가 넓어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세계 유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증산에 나서고 있어 기술자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우는 800만엔(약 7800만원) 이상, 상한을 없앨 용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도시바 반도체에 근무하는 한 기술자에게 헤드헌터사가 보내온 메일이다. 메일은 "마이크론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실력 있는 귀하에게만 하는 제의"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도시바의 합작상대인 선디스크 CEO를 역임한 산제이 메트롤라다. 마이크론은 올해 초 발표한 인텔과 제휴 해소를 계기로 자체 플래시메모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바 기술자 스카우트를 시작했다.
자동차업계도 기술자 쟁탈전에 가세하고 있다. 자동운전기술 보급 등으로 반도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작년 말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가 도시바 욧카이치 공장 개발팀을 빼내가 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5년 전만해도 르네사스와 소니, 후지쓰, 파나소닉 등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바람에 반도체 기술자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리쿠르트 캐리어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의 구인배율은 비교 가능한 2014년 1월 0.52배에서 약 4년 동안에 2.56배로 높아져 전산업 평균 구인배율을 웃돌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학생부족이 심각하다. 1990년대에 대형 전기메이커들이 잇따라 반도체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전자공학 전공자가 줄어든 탓이다. 전기업계에 오랫동안 기술자를 취업시켜온 도쿄공업대학 취업 담당자는 "반도체를 배우려는 학생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바가 생산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당장은 하락기조다. 반면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의 D램은 호황이어서 수익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라인 신설에 따른 도시바의 필요 기술인력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국내의 마지막 반도체 메모리 회사가 된 도시바 메모리 매각협상과 거액 투자에 눈이 팔려있는 사이에 기술자 확보라는 생각지 않았던 난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