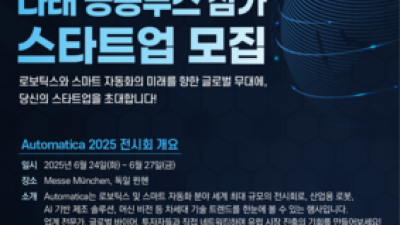이번에는 KT가 휴대폰 보조금 과당경쟁에 불을 지폈다. 통신사 보조금 ?문에 홍역을 치른지 5개월여 만에 똑같은 형태가 반복됐다. 특정 기간, 특정 모델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온라인 상점에서 KT용 갤럭시노트가 36만~39만원대에 판매됐다. 정상 출고가 99만9000원에서 60만원이나 싼 가격이다. 내장 메모리를 기존 32GB에서 16GB로 줄인 모델도 정상 출고가는 93만원대다.
이처럼 대폭 할인된 가격이 뜨자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몰려 해당 쇼핑몰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 가격에 갤럭시노트를 산 소비자들은 “횡재했다”는 반응이고,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박을 놓쳤다”고 푸념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갤노트 대란`으로까지 불렸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영업 방식으로, 경쟁 이통사에서 옮겨오는 고객에게만 혜택을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최대한도는 27만원이다. 통신비 할인분이 단말기 가격에 반영됐다고 해도 30만원대 갤럭시 노트는 규정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번호이동 고객과 신규·기기변경 고객을 차별하는 불법행위기도 하다.
KT 측은 “본사 정책 보조금은 한 달간 변함없이 유지된다”며 “일부 판매점이 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2G 종료를 기다리느라 LTE 시장에서 한발 늦은 KT의 내부 지역영업팀 단위에서 단기간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일부 판매점의 형태는 `페어 프라이스`를 시행하는 등 휴대폰 유통문화 선진화를 이끌어 온 KT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기존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뒤가 다른 행동에 “실적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조금 단속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과징금을 부과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제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통사들이 정부 당국을 비웃듯 보조금을 뿌려대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역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을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이통사들이 유통 선진화에 참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의 보조금 전쟁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며 “실시간 보조금 투입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일정 시간 영업금지` 같은 효과 있는 제재가 아닌 이벤트성 과징금 부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