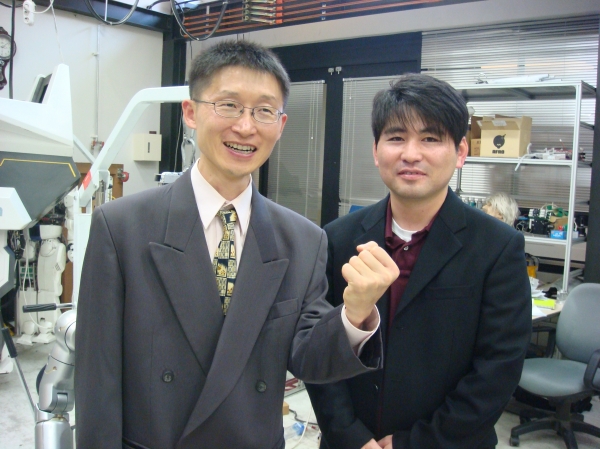
KAIST는 20년 전인 1989년 영국 서레이대학에 석사과정생들을 유학 보냈다. 이들에게 주어진 특명은 인공위성 제작기술을 배워오라는 것. 이렇게 탄생한 것이 1992년의 한국 첫 인공위성 우리별1호다. 이는 한국 첫 자력 발사체 ‘나로호’의 밑거름이 됐다.
2009년 2월, 서남표 KAIST 총장으로부터 특명 2호가 떨어졌다. 이번엔 미항공우주국(NASA)과 인력 교류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학생이 이현재(항공우주공학) 박사와 김태민(전자공학) 박사 2명이다.
NASA에서 생활하다 잠시 귀국한 이현재·김태민 박사를 최근 KAIST 휴보랩에서 만나 NASA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공부할 기회를 준 서남표 KAIST 총장과 피터 워든 NASA 에임즈연구센터 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NASA가 개발 중인 위성이나 행성 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뭔가 할 일이 엄청 많을 듯 합니다.”
이 박사가 NASA에서 하는 일은 위성궤도 설계와 자세제어 알고리듬 개발 등이다. 오는 2036년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을 관찰할 위성에 대한 궤도를 설계한다. NASA는 아포피스 소행성이 ‘정말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수칩차 위성을 발사하는데, 이 위성의 궤도를 그리는 것이 주 업무다.
이 박사는 “(NASA의) 실상 보안 때문에 하드웨어나 알고리듬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은 이론 위주로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박사도 거들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출입카드가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가끔은 ‘북한에서 왔다’고 농담을 건네도 받아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박사는 구글과 달 지형 모델링 작업을 수행 중이다.
“NASA에 근무 중인 한국인은 슈퍼컴퓨팅이나 항공관제 제어 분야 등에서 10여명가량 됩니다.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ASA도 우리나라처럼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그는 “재미 있는 것은 팀내 분위기입니다. 최근 팀 리더가 구글로 1년 파견을 나갔는데 과연 그가 돌아올지 아닐지가 화두”라고 전했다. NASA의 보수가 기업과 비교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화제가 된다고 한다.
NASA 박사급 연구원 연봉은 한국과 비슷한 10만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NASA 인근에 위치한 구글이나 야후의 석사급 인력 연봉이 9만달러고 박사급은 이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한 사명감 가지고는 NASA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이들은 나름대로 한국의 과학기술에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NASA는 연구 과제가 워낙 다양해 신기한 것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력도 그렇게 모자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처음엔 눈에 불을 켜고 배우려 했는데 때때로 수업시간에 배웠던 위성이나 알고리듬 관련 기술 등을 오히려 그들이 배우는 경우도 많았다”며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신뢰가 더 깊이 쌓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 박사는 국내에 돌아오면 위성 촬영 사진을 가공하는 원격탐사 영상분석 업무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용택 KAIST 대외협력처장은 “NASA측에서도 KAIST 파견학생의 연장을 검토할 만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는 기회가 닿는대로 매년 학생을 선발, NASA에 파견할 계획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