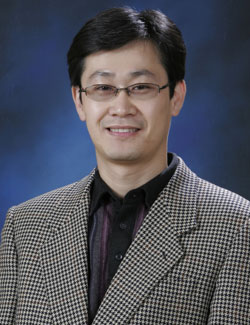
○○○ 1호.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신선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한다. 사람들의 기억에도 더 많이 남는다. 대신 다른 사람보다 한발 먼저 길을 헤치고 가느라 어려움이 따른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은 이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에서 게임학 박사 1호가 탄생했다. 상명대 컴퓨터과학과에서 학위를 받은 윤형섭 박사가 주인공이다. 게임학 박사라니 궁금함이 생긴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인지, 게임 개발을 잘하는 사람인지.
윤 박사는 “게임을 문화·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라며 “인문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에 대한 연구가 게임학”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게임을 공부하게 된 것은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간다.
윤 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문방구 앞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며 “깜깜해질 때까지 게임하다 집에 갔고, 오락실이 생겨나면서 더 게임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심이 있어서 오락실 게임 랭킹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많이 했다”며 “고등학교 때는 갤러그 100만대 돌파기념으로 세운상가에서 열린 게임대회에서 준우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게임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됐고, 대학에서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정보문화진흥원이었고, 좋아하던 게임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게임관련 일을 시작했다.
윤 박사는 “게임 시나리오 공모전, 전시회 등 게임 관련한 사업을 다 맡았다”면서 “당시만 해도 게임은 오락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 가서 논쟁도 하고, 설득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때 정보화 확산을 위해 게임이 확대 보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진로도 게임 쪽으로 바꿀 결심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게임 일을 계속하기 위해 현장경험을 쌓으려 게임 관련 벤처기업을 공동창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공부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때였고, 때마침 박사과정이 생기면서 1기로 들어가게 됐다.
그는 처음 박사과정을 공부한 세대로서 어려움에 대해 “아직은 가르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박사과정생들이 함께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게임학 박사로서 하고 싶은 일과 의욕이 넘쳐난다. 좋아하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 박사는 “운좋게 8년 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게임 개발 못지않게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다”며 “박사과정을 한 이유기도 한데, 기회가 되면 후학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윤 박사는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1위지만 영원히 1등일 수는 없다”며 “미국·일본·중국 등이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1등 지킬 수 있을지 정책제안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능성게임에도 관심이 많으며 게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게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