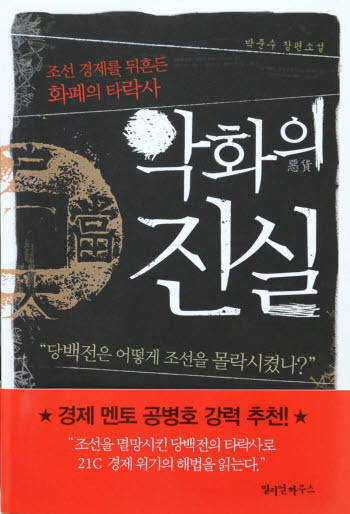
[북스-클로즈업]악화의 진실
16세기 영국의 금융전문가 토머스 그레셤은 당시 부국강병을 꿈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보낸 서신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썼다. 그 유명한 `그레셤의 법칙`이다. 순도가 서로 다른 금화·은화·동화를 동일한 액면 가치로 찍어 시중에 유통하면 실질 가치(순도)가 높은 양화는 사라지고 악화만 남게 된다는 논리였다. 양화는 비축하고 악화만 유통시키려는 인간 본성 탓이다. 금본위제 화폐 경제였던 당시 순도가 떨어지는 동전을 발행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외환 시장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귀금속 대신 지폐 위주의 신용 화폐경제로 바뀐 현대에 들어서는 그레셤의 법칙이 화폐 유통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선택적 오류나 정보 부족 때문에 같은 종류라도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설명할 때 흔히 인용되곤 한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달러가 기축통화(악화)로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누적된 폐단이 곪아터진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본격적인 휴가철,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역사 속 악화 사건을 소재로 경제 공부까지 곁들일 수 있는 팩션(faction)이 나왔다. 신간 `악화의 진실`은 대표적인 악화로 꼽히는 조선시대 `당백전`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다뤘다.
당백전은 1866년 10월 당시 우의정 김병학(金炳學)의 제의에 따라 금위영에서 주조, 발행한 뒤 이듬해인 1867년 6월 17일 중지될 때까지 약 1600만냥에 이르는 주조액을 기록했다. 문제는 당백전 1개의 명목 가치가 한때 실질 가치의 20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당시 대원군 집권기였던 조선은 경복궁 건립으로 인한 재정 확대와 서구 열강의 침탈에 대비한 군비 증강에 급급했던 나머지 악화 발행이라는 `초악수`를 택했다.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액을 남겨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다. 그 충격은 조선 후기 경제의 몰락과 민초들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당백전 발행 초기인 1866년 12월 7∼8냥 수준이었던 미곡 한 섬의 가격이 1∼2년 새 약 6배로 폭등한 것이 단적인 예다.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에서 땡전의 유례가 바로 당백전이었다는 사실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폐해가 극심해지자 1868년 5월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조선은 당백전 통용을 금지한다. 결국 근시안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조선 정부는 재정난도 극복하지 못한 채 물가 앙등과 체제 위기만 떠안은 꼴이 됐다.
어느 날 우연히 당백전 한 닢을 보게 됐다는 저자. 손때가 깊이 밴 큼지막한 동전을 보면서 돈과 함께 유통됐을 법한 삶의 숱한 애환과 사연을 떠올렸단다. 당백전을 바라보며 기쁨보다는 슬픔이, 슬픔보다는 분노가, 분노보다는 절망이 앞섰을 당시 민초들의 상처가 140여년 전으로 긴 여행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는 당백전에 얽힌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되묻는다. 오늘날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서.
박준수 지음. 밀리언하우스 펴냄. 1만3000원.
서한기자 hseo@etnews.co.kr

![[화제의책] 악화의 진실](https://img.etnews.com/photonews/1007/015337_20100728210058_958_00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