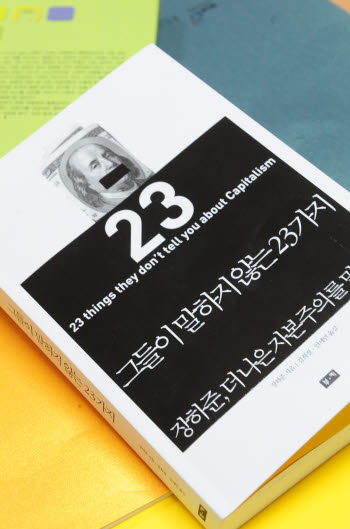눈에 자꾸 ‘공무원’이 밟혔다. 이 책뿐만 아니라 장하준의 2007년 작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2002년 작 ‘사다리 걷어차기’도 마찬가지였다. 책이라는 게 읽는 이에 따라 여러 갈래로 되새겨지게 마련이듯, 요즘 ‘올바른 경제 규제’를 화두로 끌어안은 까닭에 ‘공무원’이 계속 꼬리를 물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더욱 활력 넘치고 안정적이며 더 평등한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가 어떻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창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를 위해 “더 좋은 복지 국가, 더 나은 규제 시스템, 더 우월한 산업 정책 등이 필요(이상 339쪽)”해서다.
모두 국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337쪽)”한 때가 왔다. 30년쯤 ‘신자유주의가 마구 몰아붙인 작은 정부’에 속아 크게 실패했으니 이를 접을 때가 된 것이다. 물론 막무가내로는 곤란하겠다.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할 때가 ‘분명 왔다’고 해두자.
“우리는 개인과 기업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화함으로써 물질적 부만 쌓을 수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은행가와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공장 문을 닫고, 자연환경을 해치며, 금융시스템 자체까지 망치도록 내버려 두었다.(332쪽)” 바로잡으려면? 올바른 규제 질서부터 세워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복잡한 금융 상품의 발행을 금지(330쪽)”해야 한다. 그래야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어떤 위험과 이익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에 출시를 허용하는 승인 절차를 만들(331쪽)” 때가 됐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윤 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게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328쪽)” 시점에 섰다. 2008년 11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왜 아무도 이런 일(금융 위기)을 예상하지 못했(320쪽)”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경제학자가 없었다는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 무엇보다 실물 자산으로부터 너무 멀리 뛰어나간(파생) 망아지(금융업계)의 고삐(규제)부터 틀어쥐는 게 시급해 보였다.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302쪽)” 할 것이다. 또 “노동자들이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그에 따른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 준다(297쪽)”는 ‘복지 정책’으로 마음과 힘을 돌려야 하겠다. 일하는 이가 ‘실직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로부터 놓여나게 하라. 이게 “선진국 중 (노동 시장이) 가장 유연하다는 한국에서 인적 자원을 재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극적으로 실패하고 만(293쪽)” 이유를 해결할 열쇠다. 열쇠를 손에 쥔 사람? 큰 정부, 즉 공무원이다. 맡은 바 업무의 속까지 맑게 비치도록 사명을 다하는 공무원!
최근 물가 안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런데 “사실 물가 안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안정 지표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혹은 금융 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차압당하는 것들(90쪽)”이다. 공무원, 바로 당신! 당신에게 달려 있다.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