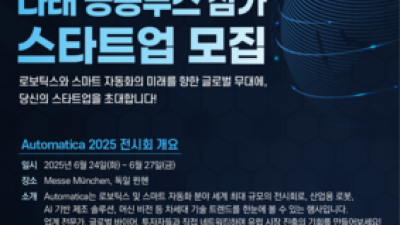땅 찾기 어렵고 수익성 안 나와‥대형사 `무풍지대`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정부는 각종 지원책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올 상반기 인허가 실적은 벌써 작년 실적을 넘겼다.
그런데 이 뜨거운 시장에서 대형사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2만9천558가구로 불과 반년만에 작년 전체 실적인 2만529가구를 약 44%(9029가구)나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안으로 6만3천여가구가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6일 현재 시공능력순위 5위권의 대형 건설업체들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곳은 GS건설이 유일하다. 그나마 GS건설도 연말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도시형생활주택 92실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2차 사업 계획은 불투명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대형사들의 `무풍지대`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독신 직장인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하는 특성상 교통이 편리한 입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의 핵심이다. 문제는 서울에서 적당한 가격의 도심 및 역세권의 부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는 데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진출하거나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서울에 그럴 만한 자원(사업부지)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열풍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공능력 7위인 롯데건설이 지난 2009년 일찌감치 소형주택용 브랜드 `캐슬루미니`를 출시한 뒤 2년간 관련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마땅한 사업지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부지를 찾았으나 평당 1~2억원대를 요구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도시형생활주택을 할만한 노른자위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땅값을 상회하는 분양가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수익이 나려면 사업비의 50% 정도가 초기 회수돼야 하는데 그럴 전망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대기업이 끌고 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명색이 대기업이고 브랜드를 걸고 하는데 작은 사업이라고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면서 "아파트처럼 대단지로 공급할 수도 없는데 고급 마감재 쓰고, 소형평면 개발하고 하면 품은 품대로 든다"고 머리를 내저었다.
포스코건설도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특별히 검토하는 바가 없다"면서 "관심은 많은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수익성 등 걸리는 게 많아 먹기는 뭣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계륵`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륵`을 집어든 업체들 역시 뾰족한 답은 없다.
최근 소형주택브랜드인 `플래티넘 S`를 론칭한 데 이어 9월 말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91가구를 분양하기로 한 쌍용건설 관계자는 "장기전으로 가면 타산이 안 맞는 건 사실"이라면서 "수익이 나는 사업모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 자체가 지역 및 임차인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모델이기 때문에 대량생산 모델을 가진 대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