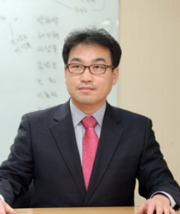2004년 델라웨어대학 박사과정 학생 웨인 웨스터먼과 교수 존 엘리어스는 핑거웍스를 창업해 멀티터치 시제품을 내놨다. 2005년 1월 잡스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인수합병하고 두 사람을 핵심 개발인력으로 영입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발하게 된다.
영국에서 욕조와 세면기를 설계하던 조너선 아이브는 컴맹이고 IT제품 기술에 문외한이었다. 그럼에도 잡스는 그에게 디자인을 맡겼다. 이후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IT제품을 연속적으로 출시해 히트 행진을 해왔다. 잡스의 천재성은 파트너를 발굴하고 무한하게 신뢰하는 데 있었다. 매출 없는 신생 기업이 개발한 매력적 기술에 대해 가치를 알아보고 파트너로 채용한 점이나 신뢰를 받은 젊은 디자이너는 제품에 사용될 재료를 분석해 독창적인 제품을 내놓았다. 이는 잡스의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도 창의성을 중시하는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고졸 채용으로 시작된 기업의 채용 방식이 최근에는 스펙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다.
◇상생 파트너십 고용에도=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고졸 채용 바람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기업은행이 특성화고 출신 20명을 창구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후 다른 은행들도 속속 동참하기 시작했다. 스펙보다 인재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은 능력을 발휘할 만한 기회조차 얻기 쉽지 않았다. 설령 기회를 잡았다고 해도 대졸과 동등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고졸 채용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해왔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률은 2002년 50%에서 지난해 19%로 급감했다. 대졸자들이 취업전선에 쏟아져 나오면서 고졸 출신이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채용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70개 특성화고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더 나아가 기업은행은 올 하반기에도 신입 창구직원 채용 인원 120명 가운데 30% 수준인 40명을 특성화고 학생중에 선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역시 1997년 이후 중단된 고졸출신 채용을 15년만에 재개해 내년 50명을 특성화고 등 고졸출신을 채용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창구직원은 245명으로, 이중 고졸출신은 38명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50명을 신규채용하면 29.8%로 증가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8개 시중은행이 오는 2013년까지 2722명의 고졸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해 평균 907명으로 지난 2년 평균 459명의 2배 수준이다.
대기업도 고졸 채용 및 처우개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신입사원 900명을 선발하는 포스코는 올해 절반 이상을 고졸 출신으로 뽑을 예정이며, LG 역시 올해 선발하는 기능직 8400명 가운데 절반을 고졸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졸 사원 100명을 뽑은 GS리테일도 올해는 150명으로 증원해 선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가도 스펙보다 ‘가치’로=새 학기 대학가에 다시 ‘취업전쟁’이 시작됐다.
30대 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4000명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대학가의 취업 준비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스펙이 상향평준화되고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즉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에 대한 스토리가 중요해졌다.
최근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마감한 삼성그룹은 스펙을 서류지원 요건 중 한가지로만 활용해 왔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 학점과 영어 점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 한 것이다. SK텔레콤도 스펙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도 학력, 전공, 나이에 관계없이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열린 채용으로 토익점수 없이 은행권에 취직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특히 그 흔한 토익 점수조차 없이 기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취업자들이 많아졌다.
인턴 활동이 구직자들의 ‘필수 경력’으로 자리매김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삼성그룹은 인턴십을 ‘채용 2.0’시스템을 도입하며 인턴십을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인턴 700명을 뽑아 그 중 93%를 신입 직원으로 채용했다. 포스코 역시 인턴십으로 신입공채를 대신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500대 기업의 인턴 채용 결산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318개 사 중 절반가량이 인턴을 채용했으며 이 중 39.1%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인턴이 취업의 ‘관문’이 된 셈이다.
◇기업 인재 선출 방식 변해야=사람이 기업의 미래란 점에서 고용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
물론 정부에 등 떠밀려 기업들이 고졸 채용숫자만 늘린다고 학력 인플레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고졸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력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
한 취업 컨설팅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으로 고졸자 채용문화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은 좋은 사례다”며 “다만 사회의 시선, 국민의 생각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고졸자 뿐 아니라 대졸자 더 나아가 인재에 대한 재정립이 고용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