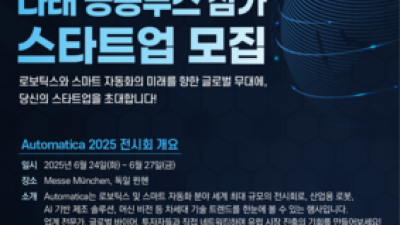인간이 동물과 달리 직립을 하면서 획득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면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이 해방됐다는 것이다. 일부 고인류학자들은 전자를 통해 언어가 발생했고, 후자를 통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게 됐다고 본다. 그러나 언어와 도구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합돼 ‘쓰기’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즉 손으로 도구에 무엇인가를 새김으로써 다른 인간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기술을 흔히 구어와 구별하여 문자라 부른다.

이처럼 손은 원초적으로 쓰기의 본질이었다. 처음에는 그림으로, 나중에는 문자를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기록했지만 손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영어로 기록이란 뜻의 ‘-graphy’는 그리스어 ‘graphein’에서 왔는데, 이는 손을 사용해 ‘새기다’ ‘그리다’라는 의미다. 컴퓨터 기술 등장 이후의 또 다른 글쓰기인 프로그램의 작성을 흔히 ‘짜다(weave)’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손으로 천을 짜는 데에서 왔다.
지금은 그런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책도 손으로 쓰여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쇄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도 문자나 그림을 써서 책을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손의 몫이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는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필경사가 책을 베껴 쓰고 장식가가 그 위에 그림이나 문양을 만들어 넣는 고된 작업 과정이 잘 묘사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손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일을 해낸다. 손으로 써서 만든 이런 책을 ‘채색 서적(illuminated manuscripts)’이라 하는데, 서적이라고 하지만 손(manu-), 즉 ‘육필’로 쓰여진 글이라는 뜻이다. 화려함의 극치인 ‘시간의 서’를 한번 보라.
15세기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도 인쇄 책은 손으로 쓰여진 채색 서적을 흉내냈다. 그것도 200년이나! 이처럼 한동안 쓰기 기술은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손을 쓰기에서 멀어지게 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쇄술이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개인적, 일상적 차원에서는 19세기 타자기가 등장하면서 손은 쓰기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가 보편화된 요즘 그 절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른바 ‘기계적 글쓰기’의 시작은 타자기라는 기계였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말대로, 타자기는 손이 가지고 있던 본질을 박탈하고 말의 영역에 난입한다. 타자기는 육필을 통해 드러나던 개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글을 동일하게 보이게 한다. 이런 사태를 하이데거는 “손으로부터 글쓰기가 물러나게 됐다”고 표현한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미디어 이론가인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는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하는 여성 타자수가 퇴근하고 영화관을 찾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타이핑이 글자 하나하나를 분절하는 일이기에 타자수는 분절된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구현해내는 영화에서 분절화가 주는 소외와 결핍을 보충하려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스타일러스 그리고 종이에 쓴 글을 읽어내 컴퓨터 기기로 전송해주는 전자펜은 역사를 한바퀴 돌아 쓰기와 손을 다시 결합하고자 한다. 과연 전자펜이라는 첨단의 쓰기 기술은 손의 원초적인 본질을 회복시켜줄 것인가.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leejh@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