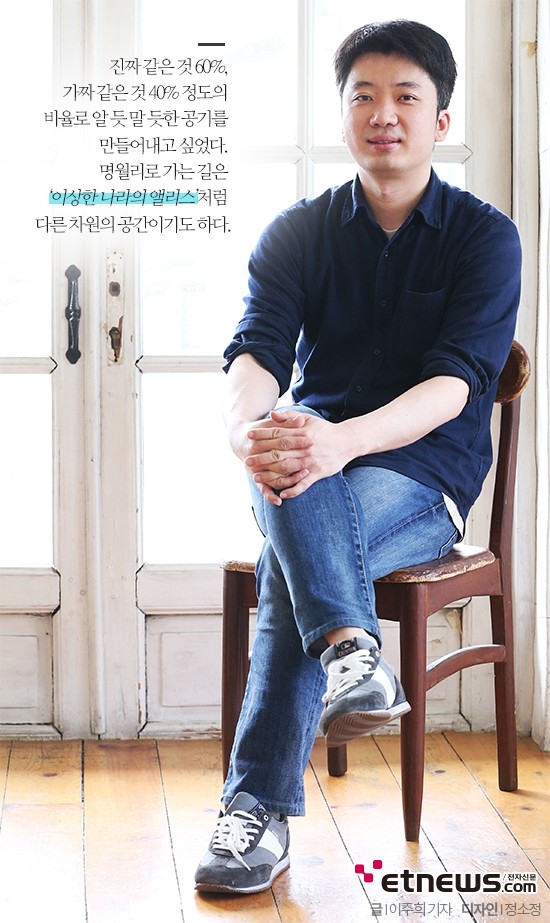
‘탐정 홍길동’은 확실히 기존 한국영화와 다르다. ‘한국영화계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조성희 감독의 작품답게 독특한 미장센과 감각적인 연출 스타일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배경을 80년대라고 설명하지만 TV 속에 나오는 상황을 제외하면 딱히 80년대로 보이진 않는다. 이 영화의 배경은 왜 하필 80년대가 되었을까. 만약 이 영화가 요즘을 배경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내용 자체가 있을 법하지 않고, 과장된 이야기다.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표현도 비슷한 식으로 가야지 설득력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는데, 현대가 배경이 되면 그럴 여지를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았다. 90년대나 2000년대는 지금과 다를 바 없고, 80년대는 여지가 있겠다 싶었다.”
“진짜 같은 것 60%, 가짜 같은 것 40% 정도의 비율로 알 듯 말 듯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그 시절을 고증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진짜 80년대와도 다르다.”
보통 한국영화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한 장면들만 CG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탐정 홍길동’에서는 실존 장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배경을 합성했다. 덕분에 극의 분위기는 동화적인 느낌과 독특함으로 가득 찼다.
“CG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됐다. 홍길동은 자기의 근원을 찾기 위해 원래 자신이 있던 공간이자 모든 일을 쉽게 했던 도시를 벗어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온다. 그동안 형성해왔던 자신의 규칙은 무너지지만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간다. 명월리로 가는 길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조성희 감독은 ‘남매의 집’ ‘짐승의 끝’ ‘늑대소년’등 비현실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을 해왔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밝은 부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초기작과 달리 새 작품들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 맞는 표현의 도구를 찾고 있다. 연출자 개인의 성향이나 일관된 원칙, 또는 변화를 논하기엔 아직까지 내 경험이 너무 적다. 열 작품 이상 하고 나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싶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매 작품마다 다른 작품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주희 기자 lee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