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올해 4월 7일 '세타2 GDi 가솔린 엔진' 탑재 차량 17만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이 결정된 하루 동안 현대차 주가는 2.36% 하락, 시가총액 7700억원이 증발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엔진 보증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6개월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 리콜을 결정하면서 늑장 리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식 무상 수리를 고집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5월부터 혼다코리아가 출고를 본격화한 5세대 신형 CR-V 차량의 경우 차체 내부 용접 부분에서 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회사 측은 문제 부위 수리와 함께 10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환불 등을 요구,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 가고 있다.
과거보다 리콜 인식이 긍정 전환되고 있지만 리콜 차량은 곧 결함 차량이란 인식도 여전히 팽배하다. 제조사들이 제작 결함을 발견하고도 리콜 대신 무상 점검을 고집하는 등 소극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에어컨이나 오디오 같은 편의 장치의 불량, 소모성 부품 마모, 차체 도색 불량, 차체 패널 녹 발생 등은 국내 법규상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주행 시 소음이나 차체 진동 같은 불만에 대해서도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리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품질 불만은 강제성이 없는 무상 점검이나 무상 수리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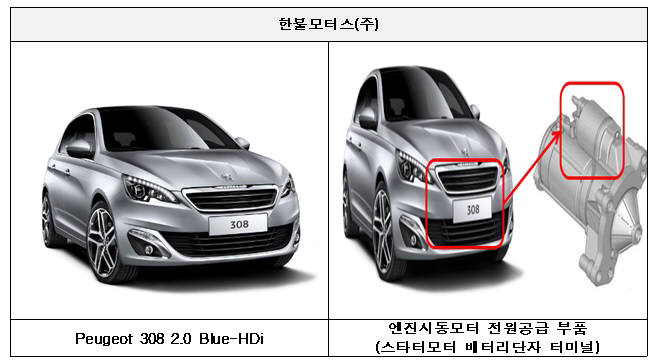
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리콜은 강제 성격으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수리 기한을 한정하지 않으며, 결함 내용을 자비로 고쳤다면 제조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무상 점검은 기한을 한정해서 수리해 주며, 기한이 끝난 경우 소비자가 별도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무상 점검은 법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결함 시정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앞세워 리콜을 장려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한국 시장보다 리콜에 적극성을 보인다. 결함을 숨기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징벌성 손해 배상과 같은 강력한 법 규제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사도 더욱 적극 리콜을 시행하도록 정부가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징벌성 보상 제도가 있어서 자동차 회사가 리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차량 판매액의 수십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한국은 리콜 관련 법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 소비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서 “정부가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