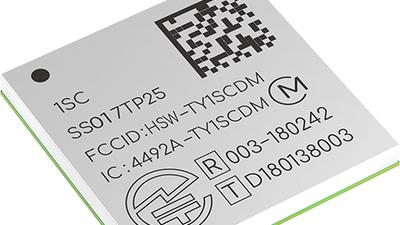![[기자수첩]종이영수증을 없애자](https://img.etnews.com/photonews/1801/1030907_20180104151426_441_0001.jpg)
언제부터인가 습관처럼 종이영수증을 꼭 챙긴다. 카드든 현금이든 영수증은 다 받는다. 막상 쓸 데는 없지만 지갑이나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10여 년 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벌인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의 효과다.
세월이 흘러 영수증 주고받기는 정부 의도대로 생활이 됐다. 그 덕분에 국민 대부분의 지갑에는 빛바랜 종이영수증이 한두 장은 꼭 들어 있다. 빨래 후 주머니 안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종이영수증을 발견한 경험도 여러 번이다. 아이가 입에 물고 빤 적도 많다.
영수증 관련 취재를 하면서 일상이 달라졌다. 종이영수증은 가능한 한 받지 않는다. 아이는 손도 못 대게 한다. 종이영수증이나 순번 대기표 용지에 포함된 비스페놀A(BPA)가 피부 접촉으로 체내에 흡수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서울대 교수팀이 지난해 대형마트 계산원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계산원의 업무 후 소변에서 비스페놀A 농도가 두 배 증가했다. 맨손으로 만지기 꺼려지는 대목이다. 하루에도 영수증을 수십 번씩 만지는 계산원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BPA는 유방암, 뇌종양, 비만, 갑상샘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이유로 BPA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8년 BPA를 독극물로 지정했고, 프랑스는 2015년에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감열지 내 BPA 농도를 0.2%로 제한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환경부가 1년 전인 지난해 1월 일부 대형마트, 유통점과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전자영수증 확산도 거북이걸음이다.
관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면 EU처럼 감열지 내 BPA 농도를 낮추는 방안이 해법이다. 연말소득 공제와 연동하거나 표준안을 마련해서 전자영수증 사용을 장려하는 것도 대안이다. 늦어질수록 BPA 노출 빈도는 커진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