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량한 겨울 강가/멍하니 서서 바람을 보네/뺨을 스쳐간 찬바람/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단지 갈댓잎 머리에 인 강물만/발치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아마 이것 흘러갈 때쯤/내 슬픈 환한 기억들도 잊히려나.(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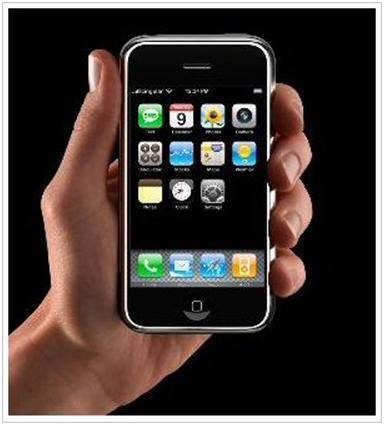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이 모습을 드러낸다. 놀라운 혁신 제품이었다. 그러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이 창안한 와해성 혁신에 끼워 주지 않는다. 발명한 것도 아니고 혁신을 이뤄 낸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9년 후 누적 판매량은 10억대를 훌쩍 넘어선다.
액센추어 인스티튜트의 펠로인 래리 다운스와 폴 누네스는 혁신에도 빅뱅이란 것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느꼈을 즈음 이미 거스를 수도, 멈출 수도 없다.
스마트폰을 보자. 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최초는 IBM 사이먼이다. 1992년 콘셉트 제품으로, 1993년부터 판매됐다. 휴대전화, 주소록, 세계시간, 계산기, 메모장, 이메일, 팩스, 게임에다 터치스크린·펜으로 메모도 가능했다. 지금 보면 구식이지만 있을 건 다 갖춘 셈이다.
1996년에 출시된 노키아 9000도 그만큼 혁신 제품이다. 겉모양은 일반 휴대폰 같다. 그러나 마치 안경집이 절반으로 열리듯 그 안에 디스플레이와 자판이 숨어 있었다. 2001년 9210에는 컬러 액정, 2004년에 나온 9500에는 와이파이와 카메라도 있었다. 컴팩의 iPAQ 등이 중간에 끼어 있었지만 결국 2007년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은 완성된다. 크리스텐슨 교수가 아이폰은 뭔가를 바꾼 혁신도, 발명도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런 스마트폰의 긴 역사 탓이다. 단지 아이폰으로 빅뱅을 느꼈을 뿐이란 말이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다.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단지 기대처럼 기술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멈춘 것도 아니었다. 1996년 제너럴모터스(GM)의 EV1이 나왔을 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2008년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내놓을 즈음 빅뱅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어느 곳에든 있다. 인도 시장에서 대부분 소비자는 질레트 면도기를 살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무리 비싸도 15루피에 맞춰야 했다. 2010년 질레트는 34센트짜리 '가드(Guard)'란 면도기를 내놓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05년에 에실로가 1달러짜리 안경을 내놓았을 때 이미 이런 빅뱅은 시작됐다. 안경이 사치품인 곳에서 3억명의 새 고객이 남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굴절 봉고차란 이동식 안경점에 있다. 웬만한 안경은 4달러, 평범한 것이라면 1달러에 제공했다.
'기억'이란 시에서 저자가 상념에 젖은 것은 슬픈 기억 탓이 아니다. 차츰 옅어져서 추억의 편린이 아쉬웠을 뿐이다. 오르락내리락 멈춘 듯하지만 결국 흘러가는 강물에 빗댔다.
빅뱅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도, 멈춘 적도 없다. 그래서 아이폰,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테슬라, 엠페사가 빅뱅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제 피할 곳이 없음이 자명해진 순간일 뿐이다. 두 저자는 그래서 혁신이 빅뱅을 닮았다고 말한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