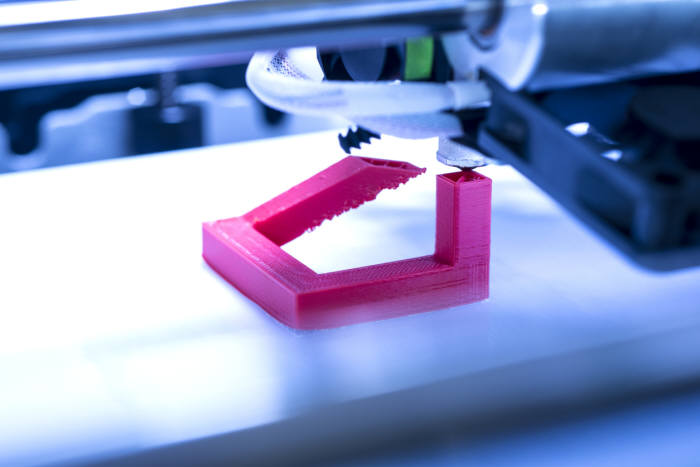
3D 프린팅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날개를 펴 보지도 못한 채 매서운 구조조정 현실에 내몰렸다. 시장 요구에 맞는 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요가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공공·교육 시장은 규모도 제한적이고, 중소기업군만 대거 몰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3D프린터 업체가 인력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인력을 줄이고 임금 체불 기업도 나타났다. 투자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품 출시 일정도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3D 프린팅 전문 A사는 지난해 말 기존 인력의 약 30%를 내보냈다. 연구개발(R&D) 인력 중심으로 마케팅 인력까지 축소했다. 회사는 몇 년 동안 꾸준히 교육용 3D프린터 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인지도는 쌓았다. 그러나 R&D비 보전 수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계속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산업용 3D프린터를 만드는 B사도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영업이익이 계속 줄었다. 지난해는 회사 전체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일부 임금체불도 불가피했다. C사는 지난해 출시하기로 한 준산업용·덴탈용 3D프린터 출시를 늦췄다. 지난해 내세운 연간 판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신제품 출시를 미뤘다. 기존보다 크기를 키운 신제품을 개발해 왔지만 당장 판매 확대로 이어질지 자신할 수 없었다. 당분간은 사업 확대보다 시장 상황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3D 프린팅 시장은 기대와 달리 장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업체가 수익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기업은 당장 수익성이 없다며 3D프린터 사업에 소극적이다. 초기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서 생존 위기까지 내몰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3D 프린팅 기업 302곳 가운데 249곳(82.5%)이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다. 주력 제품도 저가 교육용 보급형 3D프린터 위주다.
3D프린터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 3D프린터 산업은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금력을 갖추고 깐깐한 품질 평가가 가능한 기업은 신제품을 내놓지 않고도 버티지만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정책 지원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에 시작한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예산 457억원을 투입했지만 업계에 휘몰아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업계는 R&D 지원보다 신규 시장을 만들 시범 사업과 수요 확대 중심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D프린터를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만큼 지원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한 임원은 “정부가 3D 프린팅 R&D 자금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기업은 시장이 어딘지 모르고,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라면서 “일몰 사업이 많은 3D프린터 기반 구축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실제 판매가 늘어날 수요처 확대 쪽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