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추진 계획이 빠졌다. 한국은행은 은행권과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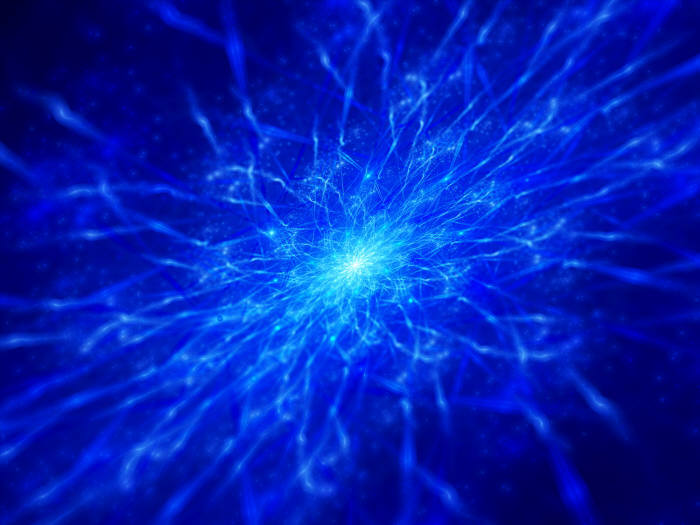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해가 넘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는 수준에만 그쳤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은 만들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가 않았다”며 “보관할 데이터 범위, 저장 공간 등에 대한 은행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정추) 참여 은행들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한은 관계자는 “조만간 은행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언제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에 제출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조차 빠졌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과제로 한국은행과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된다.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사업은 한은 금정추 사업으로 추진됐다. 소산은 데이터 사본을 원격지에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당초 벙커형 백업센터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부지 선정과 비용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전자기파(EMP) 공격으로 금융전산망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동 소산센터'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됐다.
EMP는 핵폭발로 형성되는 전자기 충격파다. 과전류를 흘려보내 전자회로를 파괴한다. 최대 반경 1000㎞ 이내 전자기기가 모두 마비된다. 금융망 마비로 거래 기록 유실 시 최소 1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비용 문제와 남북 평화 모드 등으로 사업이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이미 시중은행이 개별로 데이터 소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참여 은행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책 과제에서도 순위가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