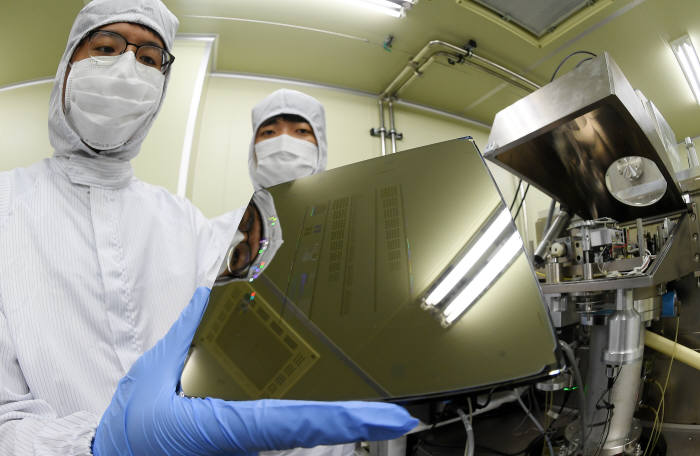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 우리 산업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소재 중심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입국 다변화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산·학·연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신문이 진행한 '소재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하자' 시리즈 결산 좌담회에 참석한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일제히 △차세대 소재 중심 국산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R&D) 기능 회복 △중앙 집중형 테스트베드 마련 등을 위한 진흥 기관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정부 R&D 사업에서 우리 희망 사항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년간 10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닌 만큼 전략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균 한국화학연구원장 직무대행도 기존 소재를 개발해서 추격하지 말고 미래 소재를 우리가 먼저 개발, 선점하고 특허 장벽을 만드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R&D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역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직무대행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때 대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대기업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제품을 쓰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망한다. 그동안 투자한 게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차세대 소재 자립도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작 국내 소재 R&D 체계가 무너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기술 R&D 파이프라인이 대학(기초 원천연구)-연구소(실용화 연구)-기업(상용화 기술 연구)으로 흘러야 하는데 출연연구소가 제 기능을 못했고, 중소·중견기업이 집중적으로 소재를 시험할 수 있는 공용 연구시설(테스트베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학의 원천 연구를 실용화해 주는 연구소 역할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면서 “기술 흐름에 따라 산업이 강해지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을 잇는 가교인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R&D 체질을 바꿔야만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실용화 연구를 산업화 연구로 잇는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면서 “국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되찾고 전체 연구 시기별로 나눠서 대학-연구소-기업이 컨센서스를 이뤄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행 기술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각 출연연 간 고유 특성과 역할이 사라지고 연구원이 과제를 따내기 위해 영업해야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도입된 것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직무대행은 “초기 국책연구소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를 했지만 이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연구는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특히 PBS가 시행되면서 한 연구 과제에 여러 연구소가 일제히 몰리고 사업을 따내지 않으면 연구원이 월급조차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신두 교수는 PBS 100%를 보장해 주는 시범사업단을 꾸려서 연구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집중형 공통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나노팹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베드는 전국에 10여개가 흩어져 있다. 기능이 서로 다르고 분산돼 있다 보니 기업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이 수년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는 전국에 흩어진 시설을 한데 모아 중소·중견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특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공통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교수는 “기존 테스트베드는 정부가 구축하고 운영은 사업단에 맡겼지만 실제 자립하기가 어려워 지속 투자와 유지보수가 어려웠다”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해 영속성을 도모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해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만기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은 “출연연의 역할 강화, 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 간 연결고리 강화, 개별 대기업 중심의 협력사 줄세우기가 아닌 전체 수요기업 중심의 생태계 재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