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과 주요 기업까지 중국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 차단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딥시크 사용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며, 언어별로 답변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 일간 사용자 수(DAU)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8일 19만155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9일 13만2781명, 30일 9만6751명 등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민간·공공에서 차단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달 4일의 경우 일간 사용자는 7만4688명이었다.
앱 신규 설치 역시 지난달 28일 17만1257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9일 6만7664건, 이달 1일 3만3976건, 2일 2만5606건, 3일 2만3208건, 4일 2만452건 등으로 줄었다. 4일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자제 공문을 하달한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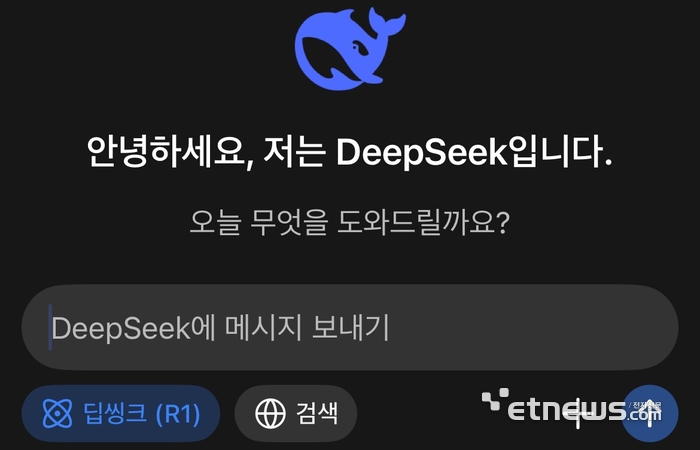
딥시크는 설 연휴 기간 중 공개된 데다 미국 오픈AI의 '챗GPT' 대비 저사양의 반도체 등 인프라에서 낮은 비용으로 개발됐음에도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됐다. 이는 서비스 초기 가입자 급증과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챗GPT보다 딥시크가 순위를 앞지르는 상황을 견인했다.
그러나 주요 기업과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보안 우려가 확산, 이용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딥시크 경계령을 내린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이름·생년월일 같은 가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인터넷 IP 주소, 고유 장치 식별자, 키 입력 패턴,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
실제로 국정원은 9일 발표한 딥시크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와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하고,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채팅 기록 등이 전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유입·활용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주 등과도 제한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광고주와 무조건 공유하고, 보유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광고주 등과 제한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는 물론 무제한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이용 약관상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입력데이터 등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언어별로 답변을 다르게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김치의 원산지를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하지만, 중국어로 물을 시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유관 기관과 협조하에 딥시크의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