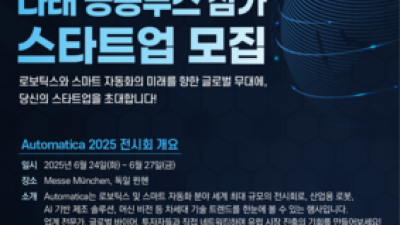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신규 업종 등록체계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5일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국회포럼'에서는 △업종별 등록제 도입 △공시·자문·평가업 규율 마련 △신유형 사업자 반영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에 머물러 있어, 자문, 공시, 평가 등 주요 기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업종별 등록제를 토대로 구성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상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면허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고, 사고가 생겨도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다.
채 교수는 “SNS에 무등록 자문이 확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지위 없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등록제를 통한 제도 편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자문, 보관, 중개 등으로 세분화하고, 업종별로 자본금 요건, 공시 책임, 정보 공개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본법에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종별 구체적인 인허가 요건과 규율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등록제는 단순히 허가를 받는 차원을 넘어 산업 내 역할을 구분하는 구조적 장치”라며 “기본법은 거래소 외에도 중개업자나 장외거래 매매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업자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를 설계해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며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