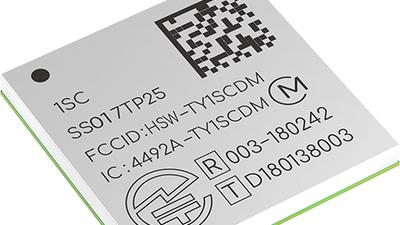◆이택 취재담당 부국장 etyt@etnews.co.kr
정통부 고위 관료들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관’으로 꼽는 이석채씨는 ‘체신부 이미지’의 정통부를 완벽한 경제부처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그의 의도였는지 몰라도 이 전 장관 부임 이후 정통부에는 유달리 그의 친정집 즉,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이동해왔다. 소위 인적 수혈을 통해 경제부처로서의 위상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간 공무원 교류는 국장급 한두명이 일반적이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관료사회 분위기도 발목을 잡는다.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진 행시 기수별 위계조직의 생리상 여타 부처에서 자리를 옮긴 정책 실무자들이 새집에서 뿌리를 내리기란 여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처간 인사교류의 성공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통부는 이례적이다. 이석채씨 이후 역시 정통 기획원맨 강봉균씨가 자리를 이었다. 서기관에서 실장급까지 기획원 출신들의 유입이 지속됐다. 한마디로 한두명의 이동이 아닌 라인업 형태의 ‘이주’라 할 수 있다. 때마침 정통부는 ‘정보화’와 ‘IT산업화’라는 국가 경영 아젠다를 선점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 동안 ‘가장 성공했고 각광받는 부처’로 발돋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통부 관료와 기획원 출신들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기획원 출신들의 맏형격인 안병엽씨는 정통부 장관에까지 올랐다. 공교롭게도 PCS사업 허가(이석채)와 IMT200사업권(안병엽)을 모두 기획원 출신 장관들이 주도한 진기록을 남겼다.
그럼에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기획원 출신은 정통부 내부에서 마이너 세력이었다. 정보화·국제협력 등 기획 파트에서 맹활약했지만 정통업무라 할 수 있는 인사와 예산, 통신과 산업정책은 정통부 출신이 맡았다. 좋게 보면 각자의 전공을 살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통부의 주류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에 들어와 역전됐다. ‘진대제 체제’에서는 노준형 기획관리실장과 유영환 정책국장, 양준철 국제협력관, 고광섭 공보관 등이 요직에 포진했다. 총리실 등을 거쳤던 변재일 차관까지 포함하면 주요 수뇌부의 절반 이상이 일종의 ‘영입파’라 할 수 있다. 기존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관료로는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과 통신 및 방송사업자를 총괄하는 김동수 진흥국장, 류필계 전파국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얼마 전 부서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까지 단행했다. 대상만 엄청난 것이 아니라 발탁승진 등 인사의 폭이 가위 혁신적이다. 신정부들어 장차관은 물론 본부 실국장과 과장급 전원이 자리를 바꾼 셈이다. 자연히 새로운 기대도 쏠리고 인사 뒤끝이어서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도 남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출신을 따지는 것은 곧 파벌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친다. 잘못된 것이다. 대학의 순혈주의가 경쟁력 상실 제1원인으로 지목되듯 교류와 교배를 통한 진보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대표적 선진부처 정통부의 새 체제가 어떻게 가동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출발점이 서로 달랐던 정통부 수뇌부가 화학적 결합을 이루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내보일지, 아니면 어정쩡한 자세로 세월만 보낼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그리고 그 단초는 정통부가 공언한대로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현안토론과 여기서 도출되는 정책기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