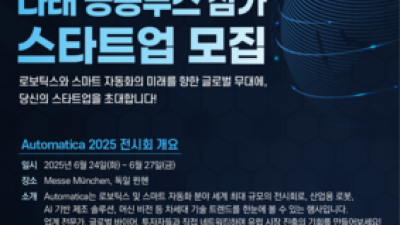독일 시민인 첸차오 리우(21)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인 페이스북 친구가 446명에 달한다. 그는 ‘아이폰 3GS’를 사랑하고, 구글 검색 서비스와 ‘구글 맵스’에 중독됐다.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시민이 온라인 교재(SNS)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유지된 독일 정부의 엄격한 사생활 보호 관련법을 뒤흔들 태세여서 더욱 주목됐다.
독일은 엄격한 정보 보호법을 갖춘 나라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정보 보호 책임을 매우 강하게 따져 묻는다. 독일의 엄격한 사생활 관련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국가 재건 과정에 확립된 산물이다. 정부 박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중죄인이더라도 그의 허락 없이 이름이나 이미지를 임의로 드러낼 수 없게 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도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구글은 함부르크 규제당국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구글 ‘스트리트 뷰’ 독일 서비스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이메일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잘못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하지 못했다.
페이스북도 함부르크에서 활동적인 이용자의 이메일 송수신 목록을 바탕으로 삼아 비회원 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조사받게 됐다. 독일 정보보호 감시당국은 애플에도 ‘아이폰 4’ 관련해 어떤 종류의 이용자 관련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요하네스 카스파르 함부르크 데이터보호감독관은 “문제는 많은 이들(독일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부주의한 것”이라며 “독일에서 (SNS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SNS가 독일 정부의 엄격한 사생활 보호 규제를 뿌리로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SNS 친구끼리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는 행위를 기존 법령으로 막는 게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구글 검색 서비스의 독일 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독일 시민이 770만명에 달하는 등 기존 법령에 근거한 일률적인 규제가 난감해진 상황이다.
첸차오 리우씨는 “많은 독일인, 특히 젊은 층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개의치 않는다”며 “어떤 결과를 낳더라도 모두 개인의 책임이다. 누구도 이런 서비스들을 쓰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