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사업자는 앞으로 이용료에 따라 통신 속도를 차등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식 망중립성’을 위해 요금 등 각종 현안문제에 망사업자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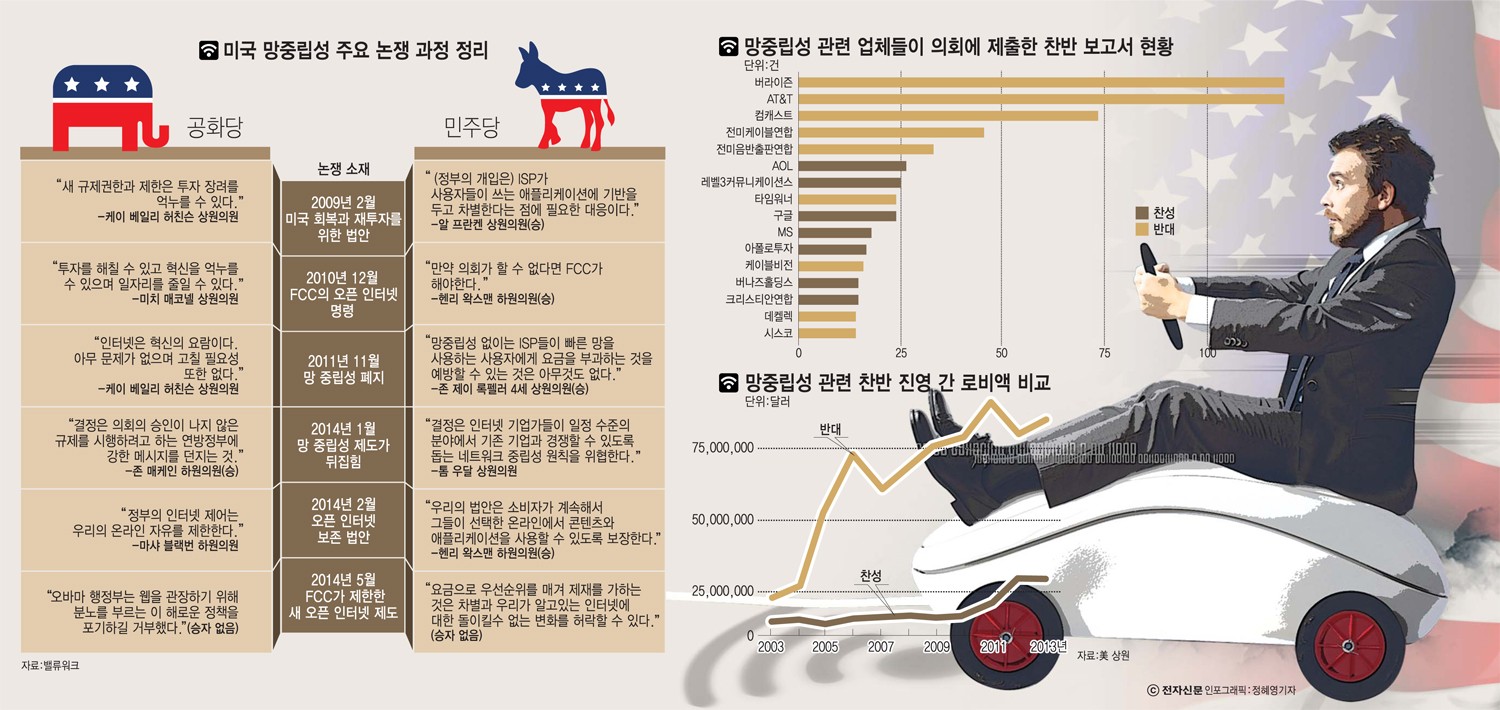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발표했다.
◇FCC 판결 주요 내용=FCC는 이날 새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 위원 두 명은 찬성표를, 공화당 몫 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FCC는 이번 안에서 ISP 등 망사업자를 연방 통신법상 ‘타이틀Ⅱ’군으로 재분류했다. 이 경우 망사업자는 전화사업자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피지정, 보편적 역무서비스(Common Carrier) 의무를 비롯해 요금 책정을 할 때 연방정부 통제권 아래 들어간다. 그간 망사업자는 통신법상 ‘타이틀Ⅰ’군에 속해, FCC 감독권이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오픈 인터넷’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입김이 막판 작용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당초 FCC는 ‘급행 회선’(fast lane) 도입 등을 염두에 둔 바 있다.
개정안은 수주일 내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식 고지된다. 이후 60일 뒤 정식 발효된다.
◇판결 의미와 영향은=“오늘은 미 통신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날(a red-letter day)이다.”
지난달 27일 표결을 마친 톰 휠러 FCC 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만큼 FCC의 이번 결정은 향후 미 통신업계은 물론이고 전 세계 IT시장에 선례이자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5월만 해도 FCC는 이용료에 따른 급행 회선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통해 오픈 인터넷에 대한 무차별적 자유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그러자 작년 말부터 FCC가 들고 나온 것이 망사업자에 대한 법정 재분류다. ISP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바뀌는 순간,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방정부의 간섭과 감독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차등 요금 부과니, 급행 회선 도입이니 민감한 문제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 타이틀Ⅱ로 사업자를 묶어 놓는 순간, 사실상 요금 인가제가 된다. 언제든 정부가 나서 고객의 인터넷 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자들의 모든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이번 FCC 안에서도 망속도 차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은 반면에 통신법상 사업자 재분류에 대한 얘기는 여러 부문에 걸쳐 적시돼 있다.
문제는 ISP와 케이블TV 등 현지 망사업자 반발이다.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제 사활 건 법적 공방(legal battles)이 전개될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FCC 결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 1조에 반한다는 게 AT&T나 컴캐스트 등 주요 망사업자들의 논리다. 외신들은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최소 3년은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한국은 미국 망중립 논란에선 한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망 자체가 대부분 초고속인터넷으로 빨라, 일부러 속도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미국과 달리 아직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별다른 부하가 걸리지도 않는다. KT 등 주요 ISP 사업자들은 이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상륙이 초읽기 들어간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등이 국내 ISP를 상대로 미국과 똑같은 철저한 망중립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국내 인터넷기업과 다른 특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풍부한 동영상 콘텐츠를 국내 시장에 풀면 전송 속도 등 망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망중립’ 원칙을 근거로 토종 콘텐츠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전송 품질을 요구해 온다면 KT 등 국내 망사업자는 이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게 국내 ISP들의 우려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FCC 안은 기본적으로 무임승차 우려가 상존한다”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특히 미국 등 외국계 업체들의 국내 상륙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크게 확대시킬 개연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