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가 렌털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2020년 렌털 시장 규모가 4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전업계에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부각되고 있다. 정수기에서 시작한 가전 렌털이 공기청정기, 전기밭솥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슈분석]전자업계 '황금알'로 떠오른 렌털시장](https://img.etnews.com/photonews/1707/970537_20170704185230_152_0003.jpg)
◇렌털 시장 2020년 40조원 규모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렌털 시장 규모는 25조9000억원 수준이다. 연평균 11.5% 성장세로, 2020년에는 40조1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가전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 렌털 시장은 지난해 5조5000억원 정도다. 2020년에는 10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 두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
렌털 시장이 커지면서 사업에 뛰어든 가전업체의 수익도 확대되고 있다. 가전 렌털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리콜 사태를 겪었음에도 지난해 4분기 렌털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33.5% 늘었다. 최근 정수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가전 렌털 업계 왕좌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분석된다. 렌털 계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웨이 렌털 계정은 1만7000여개 확대됐다. 코웨이 총 렌털 계정은 570만개 수준이다. 코웨이는 올해 렌털 관리 계정을 593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쿠쿠전자, SK매직 등도 렌털 계정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전통 렌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다. 2014년 60만개 안팎에 불과하던 쿠쿠와 SK매직 렌털 계정은 지난해 모두 100만개를 넘겼다.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렌털 시장에 가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도 최근 직수형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정수기 업체와 겨루고 있다”면서 “정확한 렌털 계정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유보다 활용하는 시대
렌털 시장의 성장은 소비 패턴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를 줄이는 가구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면서 기존의 '소유' 개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렌털 서비스는 일시불로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구에 적합하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만족도를 높이는 '나를 위한 소비' 패턴이 늘면서 렌털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렌털 시장 확대는 기존의 가전업체엔 생존을 위한 돌파구다. 성장 침체라고 불릴 정도로 뾰족한 성장 동력이 없는 중소·중견 가전업계엔 렌털 사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다. 중소·중견 가전업체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2%에 불과하다.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좋지 않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저가 중심이어서 수익이 저조하다. 그러나 쿠쿠, SK매직 등 렌털 사업을 주력하는 업체는 10%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렌털 사업이 '남는 장사'란 의미다.
렌털 사업이 가전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품목도 늘고 있다. 정수기로 대표되는 렌털 사업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장고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등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코웨이는 올해 초에만 와이파이 정수기, 가습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을 출시하며 렌털 가전 품목을 늘리고 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제품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한다. 청호나이스는 커피정수기, 제습기, 제빙기뿐만 아니라 안마의자까지 렌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 쿠쿠는 전기밥솥과 전기레인지 등으로 렌털 사업을 추진,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렌털 품목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와 협력, 빌트인 가전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중견 가전업체가 늘면서 과금 방식의 렌털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이 가전과 결합하면서 앞으로 렌털 서비스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면서 “IoT 기기 자체에 대한 렌털 수요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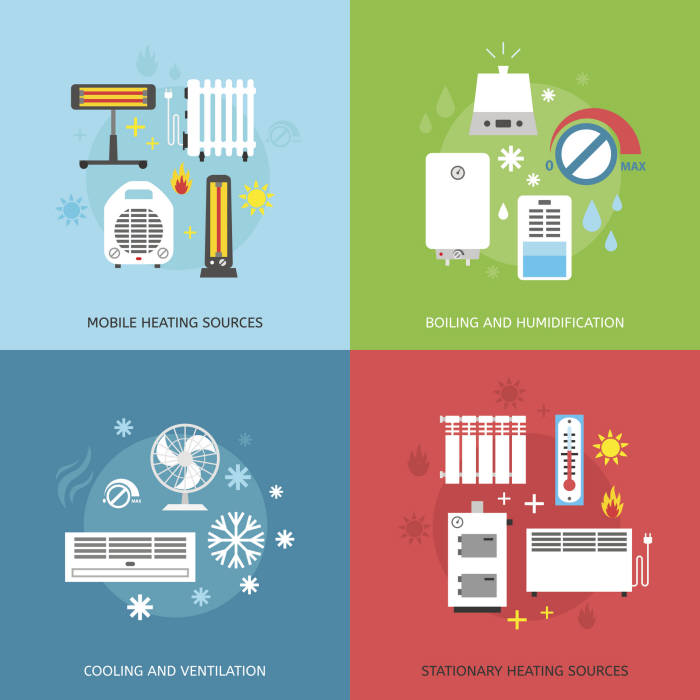
◇가전 '렌털+케어'로 승부
렌털 시장은 가전업체에 매력덩이다. 그러나 렌털 사업이 '성공 보증 수표'는 아니다. 우선 제품 판매 가격이 매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많은 가입 계정을 확보하기 전까지 사업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제품 한 대를 렌털했을 때 전체 판매 금액이 돌아오는 것은 5년 뒤로 보고 있다”면서 “자본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렌털 유지관리도 비용이다. 최근 렌털 사업은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와 결합하는 추세다. 매달 고객을 방문, 부품 교체와 사후관리(AS)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 AS 비용보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맹점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인력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렌털 사업비용을 고려했을 때 분명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서 “가입 계정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도 치열한 편”이라고 전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