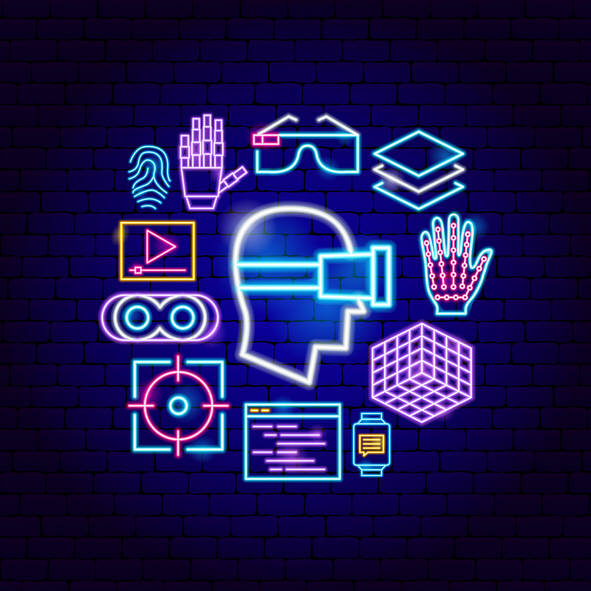
국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미디어 기기 업체는 국내 수요·유통 판로 부족으로 해외 기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비용, 관련 기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메이는 VR·AR 홀로그래픽(Holographic) 기기 핵심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2인치 이하 소형 디스플레이다. 메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제조장비 및 원재료 국산화율도 90% 이상 달성했다.
메이는 반사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인 'LCOS'형 디스플레이로 세계시장에서 일본 소니 LCOS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강준규 메이 전무는 “글로벌 기업이 AR, VR 디바이스에 요구하는 해상도는 4K UHD급 이상”이라며 “메이가 소니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결합해야 하는 국내 광학계 기술 및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CES 등 해외 전시에 참가할 때마다 중국 기업과 협업해야 했다.
해외 기업이 원하는 만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양산라인을 확장해야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아 대출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 전무는 “양산화, 기술 개발 자금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고 싶지만, 대기업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광학기술, 회로기술 등 각 분야가 아닌 완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으로서는 협업이 쉽지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도 어려움은 있다. 액츠(ACTS)는 실감미디어 관련 기술을 개발, 3년 전부터 VR용 HMD(Head mounted display)와 AR글라스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액츠는 중국·미국·유럽 등 글로벌 업체와 협업, 하드웨어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액츠도 국내에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 등 국내 유통 판로가 개척되지 않으면 제품과 기술이 사장된다. 이에 해외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국책 과제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책 과제가 매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국책 과제는 첨단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지만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품 단가가 올라가 대기업 등 고객과 가격 협상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문희종 액츠 대표는 “중국은 특정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 정부가 제품을 일정량 구매하는 제도가 있어 기업이 국가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한다”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특정 기술에 대해 의무수량 만큼 구매하고 연구 목적 또는 기업 연결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