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만만찮은 투자에 필요한 취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경마는 특히 더 그랬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의 위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로 말 세 필을 내어서 경주를 하게 했다. 대장군 전기조차 왕의 준마들을 당해 낼 수 없었다. 고사는 전기의 빈객 가운데 하나가 계책을 냈다고 전한다. “위왕의 상필엔 하필을 내고, 중필엔 상필을 붙이고, 하필엔 중피로 상대하면 이기리라.”
기업에도 변치 않는 금언이 있다. 경쟁 상대를 잘 알라는 것이야 말도 그 가운데 하나다. 물론 누가 진정한 경쟁 상대인지는 다른 문제다.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라는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숨은 경쟁자, 그림자처럼 긴가민가한 기업, 종래에 우리와는 상관없던 기업도 얼마든지 경쟁자가 된다.
만만히 봤다가 큰 낭패를 볼 상대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는 기업이다. 저가시장이 물론 만만해 보이기도 한다. 상식으로는 저가로 인해 마진이 적고, 손실을 감수한 채 버틴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들 셈법을 모른 채 단언하다가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말라리아에 걸려 보지 않고서야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말을 접으라는 것처럼 뼈아픈 경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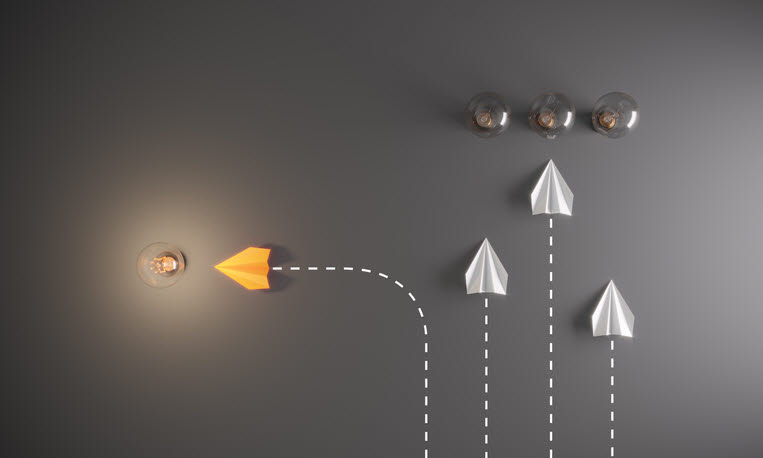
첫 저가항공사는 1981년 즈음에 나왔다. 지금 사람들은 피플 익스프레스가 쪼개져서 여러 대형 항공사에 인수된 결과만 기억한다. 그러나 사실 초기에는 전편 매진 사례를 거둘 정도로 화제였다. 대형 항공사의 주기착지인 이른바 허브 주변을 감싸 돌았다. 한 개 이상의 가방에는 돈을 받고 음료는 50센트, 맥주는 한 캔에 1달러를 받는 저가항공사 방식도 여기서 시작됐다.
사달이 난 것은 섣부른 인수합병(M&A)이자 저가 전략 탓이 아니었다. 프런티어항공 인수 후 시너지는 생기지 않았고, 저가항공에 걸맞지 않은 고급화에 보잉747기란 욕심도 냈다. 결국 부채는 기존 철학을 버리는 대신 수익성으로 옮겨 타게 했고, 정체성을 잃은 채 콘티넨털항공에 차례로 넘어간다. 어찌 보면 저가 전략이 아니라 이걸 포기한 탓이었다.
여기엔 상식과 다른 점도 있다. 이 같은 시장 바닥의 기업들이 터득한 마진율은 꽤 높을 때도 있다. 유럽 저가항공사 대표격인 라이언에어의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을 훌쩍 넘는다. 심지어 덩치가 몇 배 큰 대형 항공사를 시가총액으로도 따라잡거나 더 앞서기도 하다.
물론 여기라고 경쟁이 없는 건 아니다. 더 새로운 저가 모델과도 경쟁해야 하고, 자칫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좌석마일당 원가는 델타,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보다 25%나 낮지만 후배격인 제트블루는 이보다 25%나 더 저렴하다.
흔한 질문은 '저가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가'이다. 그러나 고급 시장이 있는 것만큼 이 시장의 존재도 역사 그 자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수익 쏠쏠한 기업이 되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 경영학자는 그 증거로 거부들 명단을 보라고 말한다.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가운데 많은 수가 저비용 비즈니스로 사업을 일군 사람들이다. 개발도상국 기업만도 아니다. 샘 월턴의 월마트, 알디, 이케아, 델, 자라는 이미 굳어진 시스템 안에서 혁신했다.
대장군 전기에게 진 그날로 가 보자. 위왕은 아마도 이날 처음으로 내기에 졌을 테고, 전기가 어디서 이런 말들을 구했는지 어안이 벙벙했으리라. 종종 저가기업의 높은 마진율도 누군가에겐 이해가 안 되는 셈법이란 면에서 비슷한 듯하다.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경영]<253>기회를 보는 남다른 시각](https://img.etnews.com/photonews/2102/1384414_20210216141000_032_0001.jpg)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