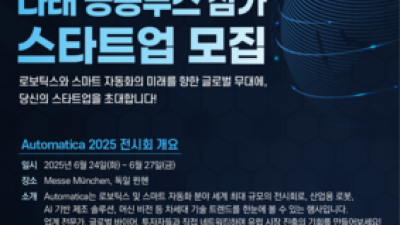공공시장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용 가능한 SaaS가 없다고 한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정부가 SaaS를 적극 도입하지 않아 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장대로 쓸 수 있는 SaaS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SaaS 제품은 43개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등에 제품 공급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제품은 28개다. 영국은 이용 가능한 SaaS 제품이 1만개가 넘는다. SW기업도 할 말이 많다. 정부가 SaaS를 제공하려면 내부 업무 절차나 특성에 맞춰 맞춤형 SaaS를 개발해야 한다. 투자해서 개발한다 해도 판매는 보장되지 않는다. 수요 예측도 어렵다.
SaaS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세계 SaaS 시장 규모가 올해 1671억달러(약 216조원)에 이르고 내년엔 1952억달러(253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aaS는 구축형 SW보다 세계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 원격 지원이 가능해 인력 이동이 적다. 반면에 외산 SW는 한국에 손쉽게 진출한다. 상용SW의 외산 독식 상황이 SaaS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SW산업 생태계는 정부 역할이 컸다. 공공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해 왔다. 다행히 정부는 SaaS 촉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귀를 기울일 만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해 'SaaS 우선 도입 제도'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지원 확대와 직접구매 의무화 도입, 공공부문 인식 변화, SaaS 도입률 기관 평가도 순위에 올랐다.
그렇다고 정부만 앞장서서도 안 된다. 기업이 보폭을 맞춰야 한다. 공공시장에만 의존하는 SW기업은 양적·질적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 공공사업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닭은 달걀을 낳고 달걀은 닭이 된다. 결국 순환논리다. 닭과 달걀 모두 필요하다면 닭과 달걀 모두를 챙겨야 한다. SaaS 도입과 개발에 민·관이 모두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ET톡]SaaS, 닭과 달걀 논쟁](https://img.etnews.com/photonews/2212/1603054_20221214151744_053_0001.jpg)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