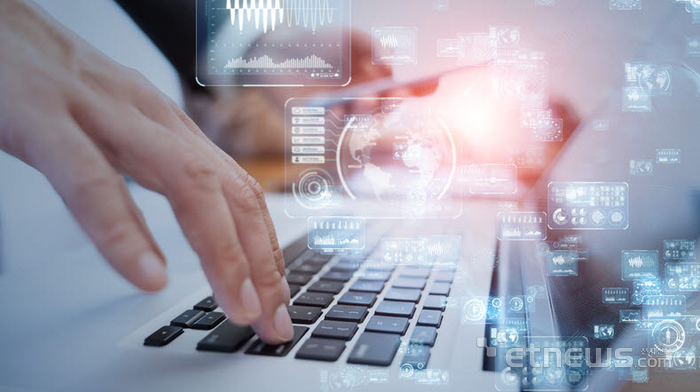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A사는 전남지역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수주했지만 고민이 늘었다. 100여명 인력이 최소 2년은 지역에 상주하며 개발을 진행하는데 체류비 등 지역근무로 인해 직원 1인당 추가 지급 비용이 월 15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내부 지원자가 적다. 지방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도 쉽지 않다.
중소 SW기업 B사는 경남지역 공공기관 SW사업 수주 후 진퇴양난 상황이다.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야하지만 지난 1년간 근무했던 직원 다섯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 이들은 B사가 내부 인력을 지원하기 어려워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이다. 지역 전문인력이 일종의 카르텔(담합)을 형성하면서 한꺼번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 발생, 인력공백으로 인한 시스템 개통 지연이 불보듯 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공공 SW 원격 개발 필요성이 높아진다. 여전히 현장에선 원격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 어려움이 갈수록 커진다.
SW 사업 원격 개발은 법으로 권고하는 방식이다. SW진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유지·관리를 제외한 SW사업을 발주할 때 SW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발주기관이 작업 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 장소 등을 제공한다’고 용역예약 조건에 담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준수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결과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2021년 1216개 SW개발사업 중)로 집계됐다. 원격 개발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과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 확대하면 40.6%다.
중견 IT서비스 업체 대표는 “공공에서 표현하는 원격 개발지는 수주기업이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이 아니라 공공이 위치한 지역에서 인근 도시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주처 내 파견은 아니지만 기업은 여전히 지역에 인력을 상주시켜야하는 상황이라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 원격 개발 실시율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SW 원격 개발 활성화는 발주처의 전향적 태도에 달렸다. 발주처는 과거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고수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투입 인력을 관리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이 사라졌다 하지만 인력이 같은 공간에 상주하길 바라는 발주자가 대부분”이라며 “눈앞에 인력이 있어야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처는 그동안 보안 등을 이유로 원격 개발을 기피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공공도 원격 개발을 도입·준비하는 등 이 같은 분위기도 바뀌는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나주 본부가 아니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원격개발센터를 마련해 대규모 차세대 사업을 추진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만 핵심 인력을 나주 본부에 파견해 시스템 구축을 매듭지었다. 한국전력공사도 클라우드 기반 원격지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면서 원격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지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사업 전체를 원격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격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에서 개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며 “원격 개발을 도입하면 코로나 등 특수 상황에서도 안정적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이는 곧 고품질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 초기 근무지 협의 단계에서 원격 개발을 우선 고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