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어느 사전은 여울물이 턱진 곳이라고 설명한다. 강이나 내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흐르는 곳을 여울이라 하니 이런 곳 중에서도 유독 두두룩한 곳을 이리 지칭하는 듯도 싶다. 그렇다고 이리 불리는 곳들 모두가 같은 모양새는 아닌가 보다. 어딘 수심 얕고 맑은 물이 흘러 여울낚시꾼들의 명소가 되는가 하면 어디는 수심 깊고 물살 빠르니 괜한 호기심이나 만용을 부리지 말라는 경고장이 붙은 곳도 있다고 한다.
혁신은 물결로 따지면 어떤 모양일까. 어쩌면 태반은 천천히 흐르는 잔잔한 물 흐르는 것이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결은 빨라지고 급기야 좁은 벼랑 사이 격랑이 눈앞에 드러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 오랜 동안 저마다 기업엔 뭔가를 만들어내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진 모양을 따서 이렇게 불렸다. 이것을 따라 기업은 뭔가를 만들어냈고, 오랜 기간 변화없이 어느새 상식이 되었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었다. 종종 더 나은 파이프라인을 찾아낸 기업이 생겼고, 이걸 더 잘 운용하면 할수록 시장에선 승자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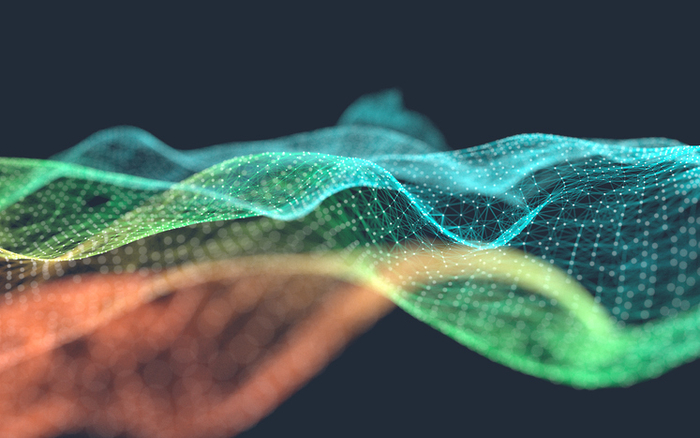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마치 디지털 세상의 승자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유통이란 입장에서 보면 매장을 전자상거래로 바꿨다는 걸 제외하면 본질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란데 다를 바 없었다.
이점에선 넷플릭스도 마차가지다. 블록버스터의 매장을 통한 방식을 한때 우편송달 방식으로 그 다음은 스트리밍이란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했고 성공했다. 적어도 초창기 이들 모두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했다는 점에 본질적 차이는 없었다. 즉, 더 나은 파이프라인은 그렇지 못한 파이프라인을 이긴다는 첫 번째 원리를 잘 실천한 모범생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언젠가부터 좀 달라져 보였다. 플랫폼이란 불리는 것이 파이프라인을 능가하는 듯싶었다. 하지만 플랫폼이란 것이 그전에 없던 것도 아니었다. 쇼핑몰을 한번 떠올려보라. 이곳엔 상점들과 소비자들이 모이는 기차역 같은 곳이었다. 신문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이건 구독자와 광고주를 연결했었다.
하지만 IT와 결합되면서 뭔가 양상은 달라졌다. IT가 만든 플랫폼을 훨씬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구축하고 네트워크 효과는 거의 비용없이 확장할 수 있었다. 실상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구글은 웹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앱을 독점하지 않았지만 노키아와 블랙베리를 단숨에 능가했고, 애어비앤비는 이 방식으로 어떤 호텔 체인보다 빠르게 객실을 확장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물결이라 불렀고,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라는 슬로건은 새 비즈니스모델의 정설이 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물론 이렇게 혁신이 멈출 리 없었다. 지금 비즈니스들을 한번 보라. 아마존이 파는 제품 중 절반은 인공지능 추천엔진이 제안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뭘 하고, 누구와 친구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브랜드에 관심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멋진 제품과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는 번영할 것이라는 점엔 변화가 없겠다. 하지만 그 사이 물결은 새 갈림길로 들어서는 듯 보인다. 즉, 고객지향이란 단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아는 곳과 고객의 ‘이런 게 있어요?’란 물음을 기다려야 하는 곳 말이다.
당신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둘 중 어떤 곳이 더 격랑을 앞두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곧 당신 앞에 이 두 다른 여울목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조만간.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