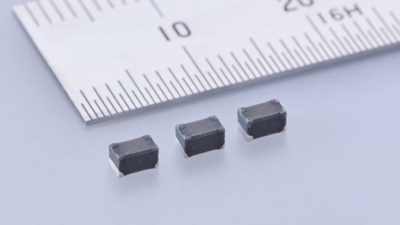풍선효과라는 게 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 미디어 시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풍선을 미디어를 구독하는 가입자나 가입세대라 비유하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유료방송의 보완재 성격으로 시작된 OTT가 이제는 대체재로 자리잡는 것을 넘어 대세를 이루면서 주류(main stream)가 되고 있다.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은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간 커질 수 있다. 풍선의 크기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미디어 시장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세대를 중심으로 한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전환은 풍선을 어느 정도 크게 하지만,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 미디어의 급성장은 전통 유료방송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풍선의 한쪽이 팽창하면 반대편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크기의 한계가 있는 풍선처럼 지금 미디어 사업자들은 한정된 고객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기를 벌이고 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자보다 뛰어난 상품성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정하게 경기를 치루는 것이 다른 것 못지 않게 중요하기도 하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경쟁을 벌이는 운동장이 평평해야 할 뿐 아니라 심판들도 공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유료방송과 디지털 미디어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엄격한 규제속에 사업을 해온 전통적 유료방송 입장에서는 유료방송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규제없이 사업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경쟁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2023년 방송산업을 뒤돌아보면 OTT, 특히 무료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FAST)와 가상의 유료방송서비스(vMVPD)의 급성장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넷플릭스처럼 주문형비디오(VoD)형태의 OTT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리니어 채널을 서비스하는 FAST와 vMVPD가 급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OTT와 전통적인 유료방송은 리니어채널과 VoD를 포함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일한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OTT는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유료방송은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채널을 전송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규제의 범위와 영역이 다른 것이다.
일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존 유료방송으로 정의한 2014년 FCC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래된 이슈이지만 이제는 새롭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케이블TV과 위성방송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전환은 기존 법과 규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 지상파방송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재전송돼야 한다는 것이다.
디즈니의 훌루(Hulu)의 지분인수가 이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디즈니가 폭스(Fox)를 인수하면서 폭스의 훌루 지분까지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었는 데, 이제는 컴캐스트가 소유한 나머지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훌루를 완전하게 소유하게 된 것이다. 리니어 채널 전송까지 하는 훌루를 소유하면서 디즈니는 유료방송회사가 된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유료방송과 본격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점에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미국 지역 지상파 네트워크사도 동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전송협상에 따른 재전송 대가가 중심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OTT사업자들을 비롯 거세게 반대하는 그룹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확실해 지는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 대세론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세는 시청자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규칙아래 경쟁을 통해 시청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성기현 연세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