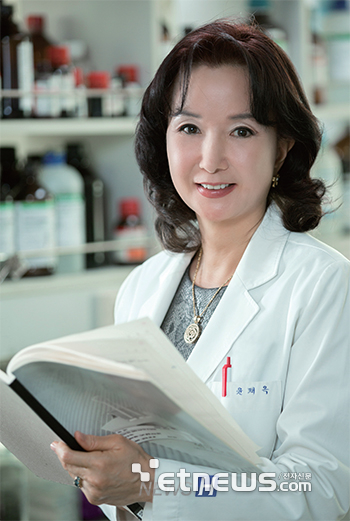

유전자세포 치료제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은 바이러스성 전달체 기반의 파이프라인 확장 및 상품화에 가속도를 내고있다. 바이러스성 벡터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전달체는 그 자체로 in vivo 유전자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부속바이러스 등), 유전자 변형-세포치료제의 제작을 위해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ex vivo 전달체(렌티 또는 레트로바이러스 등)로 활용될 수도 있어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의 핵심기술로 간주된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세포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성장률(CAGR) 99.4%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유전자치료제 시장과 유전자 변형-세포치료제 시장의 예상 규모는 각각 23.7, 22.2 Billion USD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세계 1·2위에 이를 만큼 높은 편으로 실제 국제 논문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국내 유전자세포 치료 관련 연구는 정량적, 정성적으로 글로벌 선도 수준에 있다. 그러나 상당한 R&D 투자에도 경제에 미치는 기여가 별로 없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가 어렵다. 킴리아, 임리직, 졸겐스마, 럭스타나 등 해외 허가 유전자세포치료 제품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러스성 전달체 중 허가받은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생존을 넘어 시장선도에 이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러스성 벡터의 제작 기술은 고도화 및 집약적 기술로, 완성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구축된 기술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새로운 벡터를 사용할 경우,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개발 과정에서 벡터수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는 결국 특허 이슈를 야기해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기존 상용화 전달체의 특허를 침범하지 않고 개량 특허 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독자적 기술이 개발되도록 개량형 바이러스 벡터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하에 연구자는 기존 바이러스성 벡터 전달체가 내재한 한계를 치료 효과, 안전성, 생산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한 개량형 바이러스성 벡터를 확보해야 한다. 원천기술을 확보한 개량형 벡터는 기술적으로 신약개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동일한 기술을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국내기술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정부는 기존의 바이러스성 벡터로는 극복되지 않는 미충족 의학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융·복합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형 바이러스 벡터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의 토대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바이러스 전달체 또는 기술의 융·복합(바이러스+비바이러스, 바이러스+바이러스)을 통한 독자적인 바이러스 전달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선도 기술 추격을 벗어나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기존 한계를 극복한 파괴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때,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 제품을 임상개발(clinical translation)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벡터 기술은 미래 과학 기술의 핵심 기술로 벡터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의 핵심요소인 바이러스성 전달체 기술의 발전과 바이러스성 전달체의 단계적 국산화를 위해서는 개량형 바이러스 벡터 및 혁신형 바이러스 벡터의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R&D 지원과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윤채옥 한양대학교 교수·진메디신 대표 chaeok@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