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출연연 문제의 해법`](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6/04/07/article_07162552820632.jpg)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마다 약 4조원을 투입한다. 출연연이 생기를 잃었다. 연구개발(R&D) 주도권은 기업으로 넘어갔고, 기술개발 경쟁력은 인건비가 싼 대학이나 벤처·중소기업에 밀린다.
정부는 3년 전에 자율 연구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출연연 예산은 더 깎였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표시가 나는 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창조적 파괴`가 절실하다.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
“3년 내 우리 회사 제품은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이 될 것이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우리 제품을 그렇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경쟁사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가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얘기다. 게이츠는 PC를 구동하는 윈도를 만든 후 기술 혁신을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있었을지라도 넷스케이프 등 숫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윈도10까지 만들었다. 기술 혁신은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된다. 멈추면 쓰러진다.
출연연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초기의 출연연 역할이 소진됐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알고, 출연연 구성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대 주는 입장인 정부는 출연연이 기업 R&D를 지원하고, 창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 반면에 출연연이나 구성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은 `R&D`에서 `R`(Reserch) 중심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출연연 구성원은 `과학기술자`다. 이들은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과학자`처럼 일하고 싶어 한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이직 대상으로 대학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대학 역할이 `D`(Development)보다는 `R`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출연연은 임무연계형 미션으로 나눠 기초 및 원천·응용 연구가 혼재돼 있다. 효율이 있기 어렵다. `R`를 지향하는 연구자와 `D`를 할 수밖에 없는 경영진이 늘 충돌한다.
해결 방법은 있다. 다만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출연연 전체를 현재의 혼재된 틀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누자. 국가 R&D 기능을 갖춘 전문 연구소와 기업 지원 등 사업화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응용 연구소로 나눠 과감하게 개편하는 방법이다.
대우는 달라야 한다. 국가 R&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자` 신분으로 대우하면 될 것이다. 월급은 공무원처럼 적더라도 정년까지 명예롭게 일할 기회를 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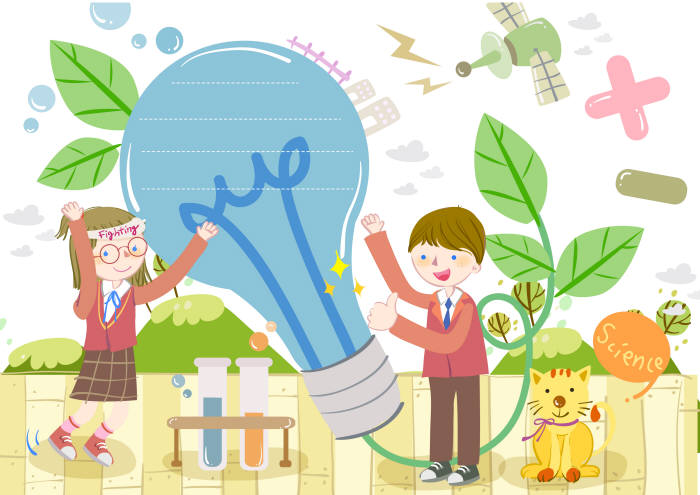
응용 연구소는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사업화 중심의 일몰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돈을 번만큼 스스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현재보다 수십배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주면 된다.
유사 사례도 있다. 2년 전 한국전자통신원구원(ETRI) 연구원 28명이 무선통신 기술을 들고 한꺼번에 나가 창업한 뉴라콤이 들 수 있다. 이들 연봉은 ETRI 직원의 2배다. 성공하면 모두 주식 부자가 된다.
출연연 스스로 도태되기 전에 정부나 과학기술계 모두 나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대전=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