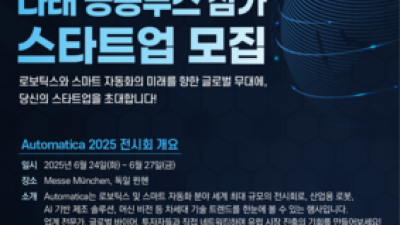![[사이언스인미디어]마션, 화성에 LTE가 설치된다면](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59815_20180408130047_219_0001.jpg)
모래폭풍에 휩쓸려 화성에 홀로 남겨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대원 마크 와트니는 치열한 생존 모험을 시작한다.
당장 식량이 문제다. 다음 탐사대가 올때까지 4년을 버텨야 하지만, 동료가 남긴 식량은 1년치 뿐이다. 마크는 기지 안에 비닐과 흙을 깔고, 남은 로켓연료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물을 만들고, 감자를 재배한다.
남은 건 지구와 통신. 동료는 마크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생존을 알리는 일이 첫 번째다. 귀환 방법도 이야기해야 한다.
마크는 1997년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긴 '패스파인더' 우주 탐사선을 찾아내 NASA와 교신에 성공한다.
패스파인더 카메라로 화성의 모습을 지구에 전송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구에서 화성으로 신호를 보낼 때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일한 전달 수단이다.
카메라가 '예스' 또는 '노' 팻말을 비추도록 해 본부의 의미를 해석하던 마크는 16진법을 응용한 의사소통 체계로 발전시키고, 별도 장비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텍스트 전송에도 성공한다.
![[사이언스인미디어]마션, 화성에 LTE가 설치된다면](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59815_20180408130047_219_0002.jpg)
마크의 목숨을 건 채팅을 넘어,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술이 곧 상용화될 전망이다.
달에서 찍은 우주의 모습을 롱텀에벌루션(LTE) 이동통신으로 지구에 생중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보다폰과 노키아, 아우디는 달과 지구를 연결하는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진행 중이다. 초경량 '우주 등급'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 중이다.
달에 손쉽게 보내고, 달 표면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 장비에 대한 실험이 상당부분 진척됐다. 독일 파트사이언티스트사는 LTE 네트워크를 활용해 달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지구에 전송하는 무인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마션의 배경이 된 화성에까지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화성에는 아직 사람의 발이 닿지 않았다. 유인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하려면 520일을 비행해야 하고, 200톤에 이르는 음식과 물, 공기를 실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도 화성까지 통신은 가능하다. 사람을 보내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한다면, 화성과 LTE 네트워크 연결도 상상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