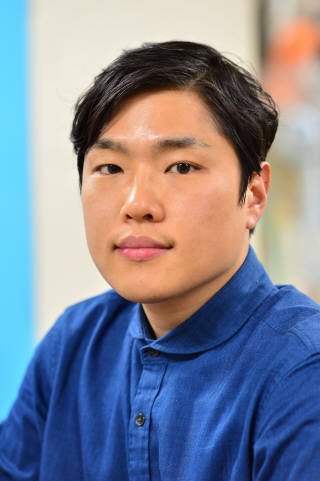
비가 많이 오는 오후 3시였다.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려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일반 호출이 잡히지 않았다.
배차 확률이 높은 기사를 매칭해주는 스마트호출이나 웃돈을 주고 무조건 매칭이 가능한 웨이고, 그리고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타다를 호출했다. 매칭은 또 불발됐고 모든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떴다.
할 수 없이 도로로 나가 손을 들고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가 일부러 지붕이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다. 내릴 때 폭우를 맞지 말라는 배려였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사이 분쟁이 한 차례 쓸고 지나간 후 일반 택시 기사의 고객 응대 수준이 한 차례 높아진 느낌이다. 경험이 반복되면 확신이 된다. 사회적 논쟁을 거치며 일반 택시의 응대수준은 상향평준화 됐다. 경쟁이 생기며 불합리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생존을 위해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과하지 않다.
반대로 기술이 관여한 진보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서울로 한정하면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웨이고나 타다는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한다. 돈을 더 내기로 마음을 먹어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정도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결국 대부분 도로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산업 갈등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일단 봉합된 상태다. 애초 논의 전면에 나섰던 카풀과 승차공유, 스타트업 대신 기존 택시산업 틀 안에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택시면허를 매입하는 이른바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곧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 모델이 만들어질 기세다.
의문이 든다. 단순히 비용을 더 주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모범택시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 스마트폰이 매개이기 때문에 혁신일까? 노는 택시는 도대체 어디 있기에 내 호출을 받지 않았을까? 모빌리티 업계가 진보성을 강조하는 빅데이터 매칭 등 스마트한 이동환경은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
정부와 산업 모두 이해와 갈등조정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편의와 구조 혁신을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볼 때다. 다양한 서비스가 자생하게 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