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신상공개'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행하고 무엇보다 직거래 플랫폼의 근본을 흔들어 스타트업 사업 활력를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2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는 북미·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대부분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이메일 인증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 미국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는 이메일로만 쉽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외에 추가 정보는 받고 있지 않다. 미국의 오퍼업(Offerup), 영국의 검트리(Gumtree)와 슈폭(Shpock), 캐나다 키지지(Kijiji), 포쉬마크(Poshmark) 모두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운영한다. 물론 게시물 등록 시 우편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메일 정보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곳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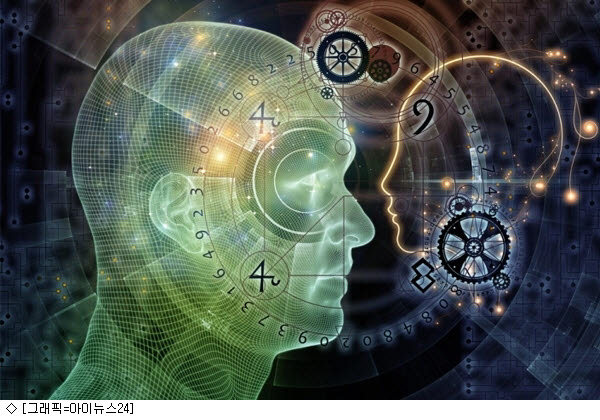
반면 한국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명목으로 글로벌 기준과 반대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집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알려 줘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1년 뒤 부터 해당 조치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등 구매자와 분쟁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원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구매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동네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거래 플랫폼의 본질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 김모(38)씨는 “신종사기, 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동네주민이 여성 판매자의 실명,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악용할까봐 두렵다”라면서 “동네에서 직거래하는데 거래 앱에 실명과 주소를 건 내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모(42)씨는 “물건 하나 팔려다가 구매자가 괜한 컴플레인을 거는데 연락을 피했다가 실명과 주소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동네사람과 중고거래는 안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직거래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는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분쟁발생 시 귀책사유·환불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 간 해결이 안되면 플랫폼 차원에서 1차 중재를 한다. 판매자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면 환불조치하라는 푸시알림을 보낸다. 해결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2차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 그럼에도 해결이 않되면 제3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직거래 플랫폼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경쟁력을 키워 미국, 유럽 등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