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컨그루어티(Incongruity). 다소 생경한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부조화를 뜻한다. 모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삶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다. 혁신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학습을 통해 지식은 축적된다. 그러나 학습효과는 곧 정체된다. 축적과 기억이 제 무게에 압도되고 망각이 스며들면 자신이 파쇄기인 마냥 기존 논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적 파괴가 돌출한다. 누구도 이 기제를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 부조화를 양립할 논리가 우리에게는 없는지도 모른다.
고전은 언제나 지혜로 향한 길을 보여 준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저작도 마찬가지다. 만일 드러커에게 혁신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 실상 그가 남긴 조언들이 있다.
드러커가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는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였다. 드러커는 “천재성에서 비롯된 혁신이 있지만 대부분 혁신, 특히 성공적인 혁신은 어떤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혁신 기회에 대한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탐색의 결과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는 '부조화'란 단어를 이 상황으로 끌어들인다.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변증한다. 윌리엄 코너는 제약회사 판매원이었다. 코너는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서 인대를 절개하는 과정에 드는 불안감을 접하게 된다. 무척 어렵거나 자주 실패하는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이것이 나머지 수술 과정과 너무도 달랐다는 점이었다. 수술 도중 이런 부조화 단계에 접어들면 긴장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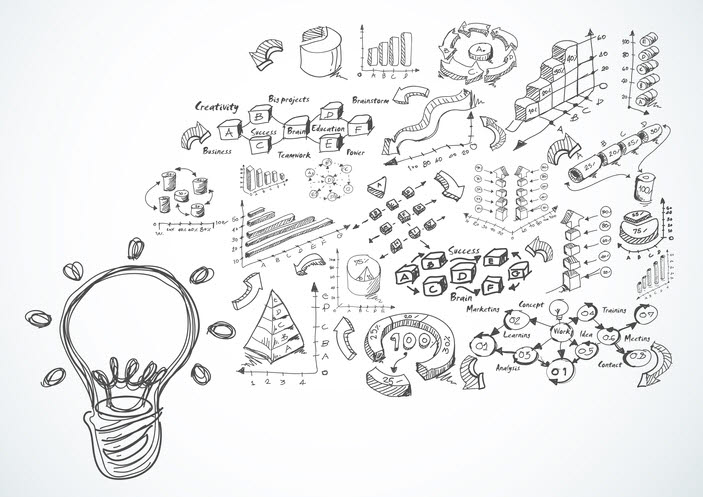
코너는 여기에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점도 알게 된다. 바로 인대를 녹이는 효소였다. 그런데 이게 금방 변질됐다. 코너는 알콘을 설립하고 보존제를 첨가해서 한동안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알콘은 전 세계 독점권을 갖게 됐고, 백내장 수술은 가장 흔한 수술 가운데 하나가 됐다. 15년 후 네슬레는 알콘을 인수했고, 지금 알콘 악티엔 게젤샤프트란 이 기업은 여전히 최고 의약기업으로 남아 있다.
해상운송도 이런 부조화가 찾아낸 혁신의 결과물이다. 1900년대 초 조선소와 선사들은 속도는 높이고 연료 소비를 줄이는 걸 수익성의 핵심으로 봤다. 그런데 50년 동안 이것은 지지부진했고, 수익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상화물 비즈니스는 고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결책은 다른 논리에서 왔다. 바로 수익은 바다에 떠 있을 때가 아니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탓에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곁눈질 한 번이면 찾을 수 있었다. 철도에 보편화돼 있던 적재된 상태로 상하차하는 로로 선적과 컨테이너 선적이었다.
드러커는 프로세스와 리듬에 숨은 이런 부조화는 혁신의 열린 창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예전에 누군가가 드러커의 책을 읽으면 조지프 알로이스 슘페터가 느껴진다고 한 적이 있다. 사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쌍벽을 이루는 누군가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대가의 사상 및 혜안에는 공통점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드러커의 부모인 아돌프와 카롤린이 주최한 살롱은 당대 빈의 지식인 사교장이었다. 여기 들른 사람들엔 음악가, 작가, 과학자, 정치가는 물론 학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명단에 슘페터가 있었다. 드러커는 훗날 “그곳이 바로 내 학교였어”라고 회상한다.
축적이란 논리에 반전은 있을까. 창조적 파괴라 말한 슘페터와 부조화를 혁신의 통로라 한 드러커에서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는 건 단지 착각일 뿐일까.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경영]<282>부조화란 혁신 통로](https://img.etnews.com/photonews/2109/1458209_20210928152435_583_0001.jpg)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