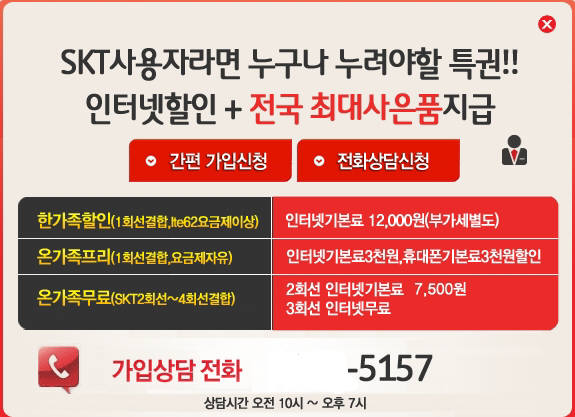
통신방송 시장의 재판매 논쟁은 처음이 아니다. 첫 논쟁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T는 1999년부터 당시 자회사인 KTF 2.5세대 이동통신(PCS)을 재판매했다. 경쟁사는 반발했다. 유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KT의 영향력이 무선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했다. 지금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SK텔레콤은 KT의 재판매가 부당하다며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2007년에는 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국회까지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KT는 2005년 9월 PCS 재판매 점유율을 6.2%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위는 그해 12월 “일부 부당한 점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KT는 당시 자사가 점유율 동결까지 한 것처럼 SK텔레콤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에는 LG유플러스가 나섰다. 2010년부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유선 상품을 재판매하면서 점유율을 높이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막대한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초고속인터넷을 원가 이하로 팔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그해 12월 “법 위반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 재·위탁 판매가 `투자 의욕`을 꺾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투자는 별로 하지 않으면서 SK텔레콤 무선 상품에 기대 시장점유율을 늘리거나 유지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SK텔레콤 재·위탁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 전이는 없다”는 반론을 되풀이했다. 지난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문제없음`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같은 논쟁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