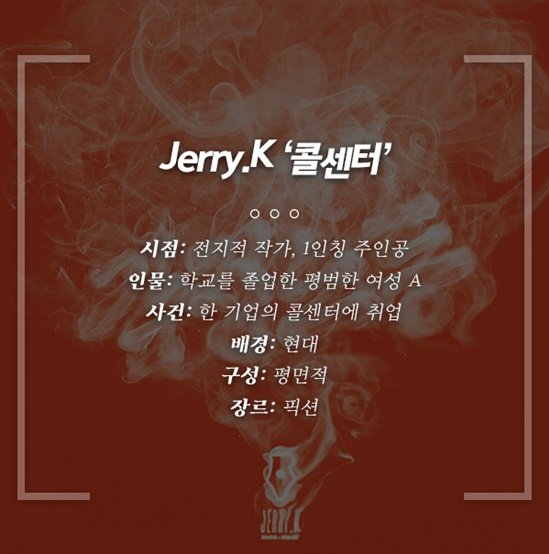
힙합은 오로지 스웩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이별, 사회 부조리, 자기고백 등 무엇이라도 주제가 될 수 있죠. 여기에 스토리텔링 기법이 더해지면 힙합은 새로운 차원의 음악이 됩니다. 한 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랩퍼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ON+힙합읽기]가 스토리텔링의 묘미를 전해드립니다.<편집자 주>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감정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힐링 체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받은 언어적 상처를 체조나 하며 혼자 삭히라니 무슨 생각이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체조 할 시간에 제리케이의 ‘콜센터’라는 노래를 듣는 게 더 유익합니다.
‘콜센터’는 지난 3월 15일 발매한 제리케이의 네 번째 정규앨범 ‘감정노동’의 10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늘 친절해야하는 콜센터 직원의 속마음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담아냈습니다. 제리케이의 탄탄한 래핑과 인디신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우효의 담담한 음색이 어우러져 씁쓸함을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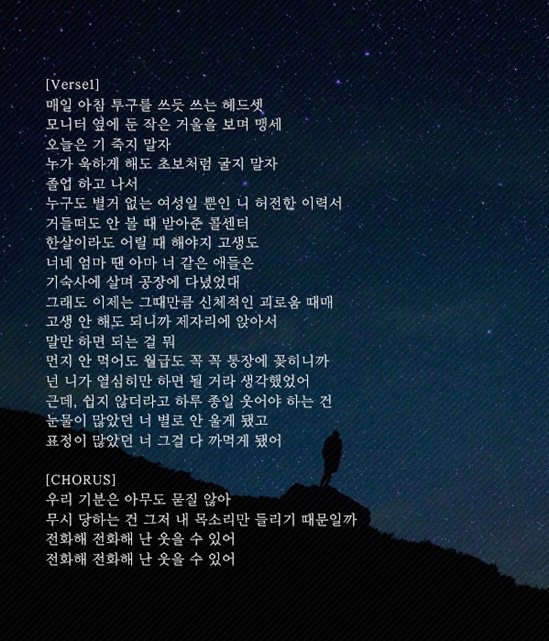
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여성 A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만 마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의 콜센터에서 그에게 연락을 줍니다. 취업에 막막했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자신을 고용해준 회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출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헤드셋을 투구처럼 느꼈고 몇 번이고 “기죽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처럼 말이죠.
노동은 크게 육체·정신·감정으로 분류됩니다. 육체·정신노동에 대해 우리는 익숙하지만, 감정노동은 1983년이 되어서야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리됐습니다. 늦게 정리된 만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합니다.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은 ‘네가 뭐가 힘드냐. 나 때는 말이야…’라는 충고로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A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네 엄마 땐 아마 너 같은 애들은 기숙사에 살며 공장에 다녔었대”라는 비교와 함께 감정노동자로서의 고충을 무시당하죠.
A는 원래 감정적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원치 않는 감정을 연기해야하는 콜센터 직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메말라가는 그의 삶은, 이제 다양했던 표정과 감정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에 A는 회사에 남습니다. 매일 고객의 기분을 묻지만 자신의 기분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무시당하죠. A는 이 이유에 대해 “내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일까”라며 고민합니다.
![[ON+유지훈의 힙합읽기] ‘콜센터’-제리케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6/12/29/cms_temp_article_29151744472707.jpg)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분출할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자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A는 자책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객에서 욕을 먹었던 이유를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수화기를 들 때마다 자신에게 숙제를 냅니다.
제리케이는 벌스1과 마찬가지로 벌스2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대조시킵니다. 감정노동 역시 육체노동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 해야만 하는 노동입니다. 육체노동자의 고충은 시각적으로 드러납니다.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감정노동은 다릅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우울한 기분을 안고 살게 됩니다. A는 이유도 모른 채 침울한 마음속을 헤엄칩니다.
![[ON+유지훈의 힙합읽기] ‘콜센터’-제리케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6/12/29/cms_temp_article_29151800387635.jpg)
줄곧 A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제리케이는 브릿지에서 과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주인공 A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대변하죠. “매를 대신 맞는 직업 같은 건가?”라고 묻는 A의 말에서는 분노가 서려있습니다. 더욱이 A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불만들 대신 들어주는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A는 쏘아붙입니다. “누구든 전화해 누구든 밝게 웃어줄 수 있어”라면서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서비스업 종사자, 감정노동자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웃고, 경청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단순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조목조목 다져보면 어딘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불평과 불만을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의 말대로 감정노동자들은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라는 비인간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A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죄송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A라는 사람일뿐입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tissue@enter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