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사전 세계로 가 보자. Living(살아 있는). Lab(Laboratory·실험실의 줄임말). 두 단어를 묶으면 리빙 랩(Living Lab)이다. `살아 있는 실험실` 정도가 직역이다. 또는 `생생 실험실`은 어떨까.
2015년 10월 어느 날 아침 독일 베를린 근처 템펠호프의 버려진 양조장에 멀끔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멈춘 지 오래된 기계들 사이에서 기름통으로 회의장이 꾸며졌다.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은 다들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다.
물류망은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에어버스, DHL, 캐터필라, 시스코의 중역들이었다. 각자 산업에서 알아주는 혁신 선도자였다. 목표는 단순했다. 파격의 해결책 찾기, 다시 말해서 `6개월 이내에 물류 관리의 신기원이라 부를 만한 해법 찾기`였다.
기존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럴싸한 벤처를 인수하기도 했다.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직접 나서기로 했다. 대신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힌 공통 과제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진 물류망. 이날 시작된 `베를린 리빙랩 프로젝트`는 34억달러의 비용을 줄이고 60억달러 가치를 만든다.
파격의 혁신은 벤처기업 몫일까. 네이선 퍼 인시아드(INSEAD) 교수, 케이트 오키프 시스코하이퍼이노베이션리빙랩(CHILL) 디렉터, 제프리 다이어 브리검영대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찾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도 아니다. 저자들은 리빙 랩 방식을 말한다.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는 `착수 가치(launch value)`다. 높은 성공 확률과 수익을 기대한다. 어떤 형태든 75%를 성공작이라 부를 만했다.
둘째는 `전략 가치(strategic value)`다. 잠재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베를린 리빙 랩은 세 개의 프로젝트로 번져 갔다.
세 번째는 `출구 가치(exit value)`다. 모든 결과물이 당장 제품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은 어딘가에 사용된다. 베를린 프로젝트 경험은 내부 공급망 혁신에 촉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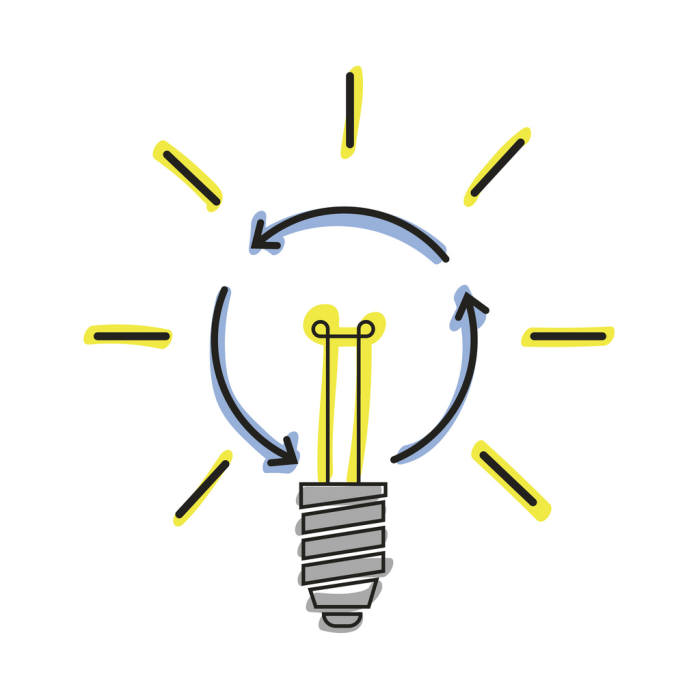
어떻게 해야 할까. 시스코는 네 가지를 택했다. 첫째로 포커스 존을 정하라. 시스코는 헬스케어, 물류, 리테일을 꼽았다. 모두 면대면 방식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었다. 기회의 창이 열려 있나 보라. 가치를 극대화할 파트너를 찾으라. `에코시스템 혁신` 방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로 가치 있는 문제를 찾으라. 시스코는 이것을 갈망(ambition)이라 부른다. 소비자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으라.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베를린 프로젝트의 갈망은 `적응성 배송(adaptive delivery)`이었다. `미리 주문을 예측하고, 주문 즉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혁신 방식`을 뜻했다.
셋째로 프로토 타입을 만들라. 리빙 랩이 작동한다. 최고경영진이 직접 참여한다. 이틀 동안 시제품-테스트-학습 사이클을 몇 번씩 반복한다. 심지어 아이디어 30분, 프로토 타입 30분, 소비자 테스트와 피드백 30분 단위로 사이클이 돈다.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다. 데이비드 워드 시스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 방식을 스피드 혁신이라 부른다.
“이것은 종래의 연구개발(R&D)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R&D란 목표가 뭔지를 알 때 작동하는 것인 반면에요.”
넷째로 영감을 돋우는 환경이다. 양조장에 들어선 CEO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밝은 무대가 있다. 영화 `마션`의 특수효과를 맡은 테리토리스튜디오가 모션 그래픽스 기술을 시연한다.
구글 글라스를 만든 톰 치가 나와 말한다. “시제품 모형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만 하세요. 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세 저자는 이 방식을 에코시스템 방식이라 부른다. 파트너를 모은다. 문제를 공유한다. 짧은 혁신 사이클을 동원한다. 프로토 타입을 만들고, 신념을 확인한다. 매시업이라는 단순 용어가 더 들어맞아 보인다.
리빙 랩 경험은 모두 제품, 기업 문화, 산업의 경계선 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으깬 감자 같은 혁신이랄까. 기존 방식이 한계에 다다를 즈음 이 방식은 빛을 발한다. 어차피 누구도 온전히 갖지 못한 것에서 찾는 혁신 아니던가.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